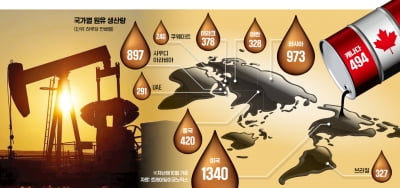美 겨냥한 비난 쏟아내며
한·미·일 안보체제 '균열' 시도
체제 다른 韓·中 공존은
한·미동맹 기반한 세력균형 덕분
'한류금지 해제' 목매선 안돼
현승윤 이사대우·독자서비스국장

왕 장관은 미국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며,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책임있는 나라와 함께 다자주의 이념을 견지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지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초석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정작 다른 나라를 ‘동등’하게 대우해본 적이 없다. 대국(大國)의식이 뼛속 깊이 각인돼 있는 나라다. 19세기 아편전쟁 때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은 것은 홍콩을 빼앗긴 게 아니었다. 중국이 다른 나라(영국)와 ‘동등한 자격’으로 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었다. 난징조약에 ‘중국과 영국 관리들이 완벽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문제였다.
미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를 이끌어낸 외교관 헨리 키신저는 저서 《중국 이야기》에서 “야만인들이 천자(天子)와 정치적으로 동등하다는 원칙이 확립된다면 중국의 세계관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터였다”며 “(중국) 왕조는 천명(天命)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뒤 청 왕조는 ‘천명’을 잃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이 휘청거리자 옛 중화질서를 부활시킬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등과 영해분쟁을 벌였다. 2010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의 때 중국 외교장관이던 양제츠()는 주변 국가들이 동등하게 대우해 협상해달라는 요구에 “중국은 대국이다. 여기 있는 어떤 나라보다 크다”고 말했다. 주변의 작은 국가들은 대국에 순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랬던 중국이 느닷없이 서울에서 “대국이 행패를 부린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왕 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며 미국을 공격했다.
일본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100년 전 두 나라 국민은 약속이라도 한 듯 국가를 멸망으로부터 구하고 민족의 생존을 도모하는 애국주의 운동을 시작했다”며 “중국의 5·4운동과 한국의 3·1운동,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역사 감정을 부추긴 것이다.
‘한류금지령 해제’ 카드도 흔들었다. 왕 장관의 방한 일정이 끝난 직후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과거 중국이 조공 국가 지위를 부여하면서 교역권을 줬던 사실을 떠오르게 하는 조치다.
한국과 중국은 예전에 사이좋게 지냈다. 유교 기반의 왕조사회라는 체제의 동질성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은 다원주의 정당 체제를 갖추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중국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 서구식 민주주의도 반대한다. 공산당이 사회를 통제하는 전체주의 국가다.
이렇게 다른 두 체제가 인접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절묘한 세력 균형 덕분이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한·미·일 안보체제가 중국의 팽창 욕구를 억제했다.
많은 언론은 왕 장관의 서울 발언을 “미국을 향한 공격”이라고 보도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을 때린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공격한 것이다. “새로운 공동 인식이 반드시 형성될 것”이라는 그의 말이 그래서 무섭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을 한국인의 머릿속에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사드 보복 해제’를 여전히 갈구하고 있다. 얄팍한 정치적·경제적 대가에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
hyunsy@hankyung.com


![[현승윤 칼럼] 지소미아 사태로 드러난 한국 외교의 민낯](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07.19382603.3.jpg)
![[현승윤 칼럼] 문재인 정부엔 '경제 영토' 개념이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07.1938260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