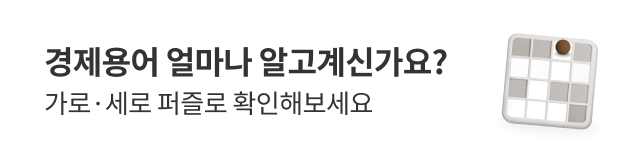이들이 정부에 물자를 공급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국가 공인 상업특구에서의 독점권이다. 다른 상인들이 도성 안팎에서 같은 물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이 바로 금난전권(禁亂廛權)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긴 난전(亂廛: 자유상인)을 규제하는 특권이다. 재정 위기에 처한 정부가 육의전을 통해 고액의 상업세를 거둘 수 있게 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물론 고액 세금이 여섯 종류의 시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정조 때 ‘금난전법을 정한 초기에 9개의 시전은 한성부가 난전행위를 단속하고, 그 밖의 5개 시전은 시전상인에게 난전상인을 붙잡아 바치게 한다’는 기록이 있다.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이 14개로 늘었다는 얘기다. 그만큼 상인들 간 싸움도 치열했다. 육의전 규찰대가 난전상인을 잡아 벌을 주는 사형(私刑)까지 횡행했다. 이 때문에 전국의 보부상이 남산에 수천 명씩 모여 육의전과 맞서기도 했다.
행상 단체인 보부상보다 육의전 조직은 더 탄탄했다. 전(廛)마다 도가(都家)라는 사무실과 도중(都中)이라는 동업조합을 만들었고 조합원을 도원(都員)이라 했다. 임원은 도원들의 선거로 선출했다. 의결기구에는 도령위(都領位)·대행수(大行首)·수령위(首領位)·부령위(副領位)·차지령위(次知領位)·별임령위(別任領位) 등이 참여했다. 그 밑에 4단계의 실무 계급을 뒀다. 김주영 소설 《객주》의 주인공 천봉삼이 “장사의 기술로 싸우자”며 도전장을 낸 신석주의 지위가 육의전 최고 실세인 대행수였다.
그러나 금난전권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는 없었다. 사상도가(私商都賈)들의 난전, 궁가와 고관 가노들의 권력형 난전, 군졸들의 생계형 난전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도시가 발달하고 상품 종류가 늘어나면서 독점제도의 폐해도 커졌다. 결국 1894년 갑오개혁으로 육의전은 사라지고 상업은 자유를 맞았다. 선교사 아펜젤러가 서점과 예배 장소로 쓰기 위해 육의전 거리에 집을 마련한 게 1890년이었으니 바로 시장자유화 직전이었다.
육의전의 전통은 동대문 포목상가와 광장시장 등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