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팝나무란 이름도 이밥(쌀밥)에서 왔다. 꽃이 많이 피면 벼농사가 잘 돼 쌀밥을 원없이 먹게 된다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立夏) 무렵에 꽃을 피우는 입하목(立夏木)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어떻든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꽃인 건 틀림없다.
이팝나무꽃이 피는 시기는 가장 배고픈 보릿고개 즈음이다. 춘궁기에 굶어 죽은 자식의 무덤가에 이 나무를 심어놓고 죽어서라도 흰 쌀밥을 마음껏 먹기를 비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니 그냥 꽃이 아니라 밥꽃이다. 오래된 이팝나무가 있는 마을마다 전해오는 이야기도 비슷하다. 노인들은 이팝나무 꽃이 많고 적음에 따라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물이 풍부한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여서 강수량에 따라 꽃의 모양새가 다르니 벼농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
가을에는 쥐똥나무 열매보다 조금 큰 타원형 열매가 달린다. 자세히 보면 열매가 달리지 않는 나무도 있다. 그건 수그루다. 암그루만 결실을 맺는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팝나무가 전국에 7그루 있다. 200~500년 된 나무도 수십그루나 된다. 어청도와 포항에는 넓은 군락지까지 있어 해마다 장관을 이룬다. 공해와 병충해에 강해 가로수로도 인기여서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팝나무보다 조금 먼저 피었다 지는 조팝나무꽃도 밥꽃이다. 어린순은 나물로 이용하고 뿌리는 한방 약재로 이용하니 더욱 그렇다. 최근엔 조팝나무에서 해열제의 대명사 격인 아스피린 원료를 추출함으로써 조팝나무 학명의 일부분이 약 이름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주로 산야에 자라지만 요즘은 도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키가 2m 이하로 작고 꽃잎은 앙증맞은 달걀 모양이다. ‘조팝나무 꽃 필 때 모내기하고 콩 심는다’는 속담도 먹는 것과 맞닿은 말이다.
지천에 핀 꽃무더기에서 밥을 생각하며 허기진 보릿고개를 넘었던 옛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피라미 은빛 비린내 문득 번진 둑방길/ 어머니 마른 손 같은 조팝꽃이 한창이다’고 노래한 유재영 시인의 시처럼 이렇게 밥을 닮은 꽃들의 이름에는 아련한 눈물이 함께 묻어 있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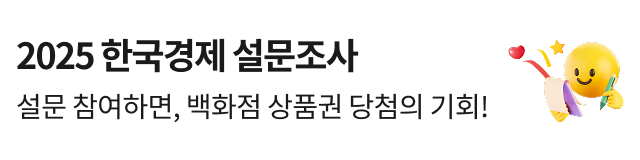
![[한경에세이] 4000P 앞의 청년](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7.41609648.3.jpg)
![[차장 칼럼] 오프라인은 죽지 않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7.36897407.3.jpg)
![[이응준의 시선] 거짓에 대한 과소평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7.2353692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