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영국 등 유럽 비중 '뚝'
최근 파키스탄·페루도 합류
수상자 국적 다양해져

○이론보다는 실사구시형 연구 각광
근래 수상자를 살펴보면 노벨 경제학상의 관심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적 난관을 풀어나가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 규제와 기업 간 역학관계 연구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장 티롤 프랑스 툴루즈1대학 교수와 게임이론을 시장설계에 접목해 2012년 수상자로 선정된 앨빈 로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2010년에는 경제정책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 노동경제학의 대가 피터 다이아몬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반면 개발경제학 분야는 1979년 이후 수상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경제성장론과 경제사 분야도 노벨상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효율적 자원배분과 일반균형이론 등의 거시모델 역시 2000년 이후 노벨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70~1990년대 노벨 경제학상 단골수상 분야였던 거시경제학도 2000년 이후 노벨상과 인연을 맺지 못하다가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공로로 2006년 수상하면서 명맥을 이어갔다.
과학 분야 노벨상은 연구 성과가 나온 뒤 수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데다 이론을 증명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199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폴 디랙은 26세에 발표한 양자역학 연구로 31세에 상을 받았다. 반면 피터 힉스는 1964년에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했지만 증명이 어려워 2013년에야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었다.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가지타 다카아키 일본 도쿄대 교수는 스승 고시바 마사토시 도쿄대 명예교수(200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연구를 이어받아 결실을 맺었다.
○미국 독식 심화…유럽은 퇴조
노벨 경제학상뿐 아니라 6개 부문을 통틀어 수상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갈수록 ‘미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노벨상 수상자 112명을 출생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미국이 45명으로 40.1%를 차지했다. 19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노벨상을 받은 871명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인 비중은 29.5%(257명)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 출신 수상자 비중은 작아지고 있다. 노벨상 전체 수상자 가운데 유럽국가 출신 비중은 319명으로 전체 817명 중 36.6%를 차지했지만 최근 10년간은 25.0%(28명), 최근 5년간은 22.4%(13명)로 뚝 떨어졌다. 다만 최근 들어 국가별 다양성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파키스탄(노벨 평화상)은 지난해, 페루(노벨 문학상)는 2010년 77개 노벨상 수상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여성 노벨상 수상자는 전체 46명으로 5%에 그치고 있지만 비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임근호 기자 sgle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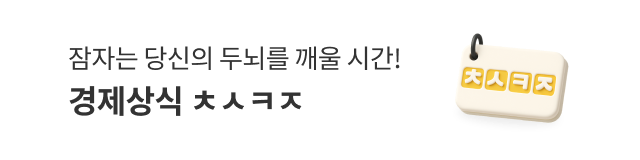
![[포토] ‘노벨평화상’ 시상식 못 온 마차도…딸이 대리 수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64311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