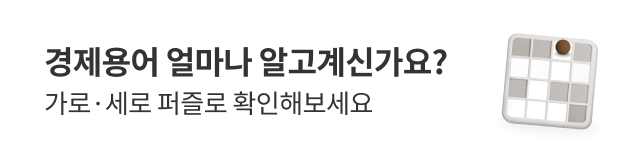자원배분 방식으로서 줄서기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시간도 돈만큼 가치가 있는데 온전히 허비하게 만드는 탓이다. 따라서 시장경제 체제에선 줄서기 회피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왔다. 은행 번호표, 놀이공원 패스트트랙, 예매, 예약 등이 그런 사례다. 버스나 화장실 한 줄 서기처럼 시민들 스스로 관행화한 줄서기도 있다.
그럼에도 줄을 서야 하는 곳에는 암표상이나 줄을 대신 서주는 알바가 등장한다. 비용을 지불할 용의는 낮지만 시간이 많은 사람과 지불용의는 높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 간에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다. 선착순이 초래하는 비용과 비효율을 줄인다는 점에서 경제학자들은 줄서기보다는 암표가 덜 나쁘다고 본다. 반면 도덕주의자들은 돈으로 새치기 권리를 산다고 비난한다.
줄서기는 누구나 짜증나는 일이다. 고객의 불편은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경영학에선 고객의 대기시간을 이론화한 큐잉이론(queueing theory·대기이론)이 널리 활용된다. ‘queue’는 매표소나 계산대에 늘어선 ‘줄(line)’을 말한다. 본래 덴마크 수학자 A K 얼랑이 1909년 교환원이 연결해주는 전화 통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한 수학이론에서 출발했다. 서비스 수행자(server) 수, 평균 일처리 시간, 시간당 고객수를 토대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적정 서버를 계산하는 것이다. 마트 계산대 수, 톨게이트 수, 커피점 테이블 수, 콜센터 상담원 수 등을 큐잉이론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곧 투자비와 직결되는 것들이니 줄서기도 경제·경영이론의 주제가 되기 충분하다.
애플 아이폰6가 출시된 지난달 31일 새벽부터 또다시 긴 줄이 늘어섰다. 지난 2월 소위 ‘동대문 대란’ 이후 정부가 밤샘 줄서기를 없애겠다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서둘러 제정했지만 법 시행 한 달 만에 줄서기가 재연된 것이다. 꼼수 청부입법이 국민의 통신비는 높이고 외국업체만 신바람 나게 하고 말았다.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을 모르는 정부가 언제 또 헛발질을 할지….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