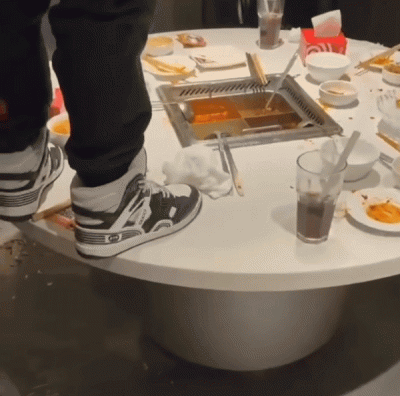우리도시들은 3차원 공간인 듯 해도 실은 2차원적인 발상에 의해
극히 평면적으로 만들어진다.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노랑(주거) 빨강(상업) 파랑(공공시설) 보라(생산시설
) 초록(녹지)등으로 땅나누기를 하고 다시 개별필지로 나눈다.
건물은 필지안에 "그냥"올라갈 뿐이다.
건물과 땅이 따로 놀고,길과 건물이 제대로 연결 안되고,사람과
차가 충돌하고,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접속된 공간이 층층이 쌓일
뿐이다.
평지건 경사지건 산등성이건 상관없이 그저 똑같은 건물이 들어설
것이 상정되고 또 그렇게 지어진다.
컴퓨터가 접속되어 있기만 하면 인텔리전트 도시가 되는 것일까.
위성TV와 인터네트를 즐기기만 하면 코스모플리란 정보민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일까.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깔리기만 하면 누구나 신정보시대의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새로운 생산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
정보네트워크가 우리의 생활공간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진정 시공을
뛰어넘는 4차원정보로 활용할수 있을까.
불행히도 우리의 도시 만드는 제도적 틀과 실무관행은 2차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할 뿐 더러 정보화시대의 신공간을 창출하기에
역부족이다.
인공대지,공중활용,지하활용,입체공간연출,수직수평의 종횡무진의
연계망은 꿈꾸기 어려울 정도로 평면적인 발상이 횡행한다.
정보화를 논하면서도 "정보화의 공간화"에 대한 실용적 논의는 빠져있다.
텔레포트 같은 특정지구의 개발촉진만을 논할 뿐 정보화가 결국
도시공간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기능과 공간구성을 갖는 새로운 건축을
요구함을 잊고 있다.
도시는 3차원 공간과 4차원 정보가 엮이며 새로운 생산과 문화가
창조되는 곳이다.
한정된 땅을 여하히 활용하여 생산성 높은 더 큰 땅을 만드느냐,여기에
어떻게 유용한 정보망을 엮어 사람간의 기능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이것이
도시가 생산중심이 되는 신시대의 시공을 뛰어넘는 창조적 과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


![[한경에세이] 서학개미에 위로를 전하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9806375.3.jpg)
![[이응준의 시선] 최악의 악, 선관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23536927.3.jpg)
![[차장 칼럼] '더 폴'의 기분 좋은 역주행](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875014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