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중국의 대학기업이 베이징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칭화대 대학기업의 연매출 역시 461억위안(약 8조4000억원·2013년)에 달한다.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인수를 추진한 칭화유니그룹도 칭화대 대학기업이 설립한 칭화홀딩스 소속이다. 중국에는 이런 기업이 대학마다 널렸다. 중국 교육부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552개 대학이 5279개 기업을 운영 중이다. 연간 총 매출과 순이익도 각각 2081억위안(약 37조4000억원), 83억위안(약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한국 대학은 거의 구멍가게들이다. 국내 대학이 대학기업에 눈을 돌린 건 대학이 기술을 출자해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허용된 2008년부터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대학기업은 53개 대학에 201개가 세워진 정도다. 연간 총 매출도 중국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922억원에 그친다.
주목할 것은 중국 대학들이 30여년 전부터 기업을 키워 재정을 충당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 온 데 반해, 서울대 등 국내 대학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에 안주하며 기술사업화에 소홀한 결과가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만 해도 정부에서 매년 450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받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11년 국립대 법인으로 명패를 바꿔달았지만 재정을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그대로다.
물론 정부 규제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혁신할 의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학이 먼저 재정자립에 대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중국 대학에까지 밀리면 한국 대학은 설 땅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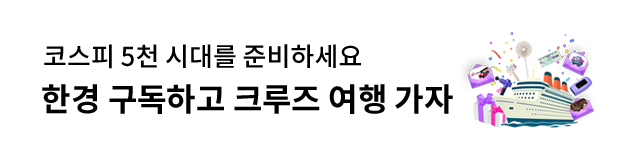
![[기고] 기업 경쟁력 갉아먹는 법인세율 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35142654.3.jpg)
![[한경에세이] 서울시민의 출근길을 지키는 방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42301768.3.jpg)
![[다산칼럼] 단자사·종금사 퇴출 교훈 잊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2787708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