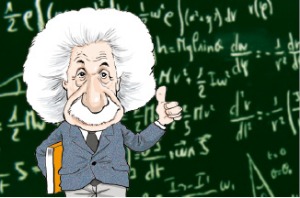
이들 천재 옆에서 좌절을 겪는 수학자들의 얘기는 더욱 흥미롭다. 유진 위그너는 소립자구조론으로 196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다. 그는 원래 수학을 좋아한 수학과 지망생이었다. 하지만 대학서 폰 노이만을 만난 뒤 그의 꿈은 바뀌었다. 그의 수학 실력도 탁월했지만 노이만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었다. 위그너는 결국 수학의 길을 포기하고 이론물리학자가 됐다. 노이만이 죽은 뒤 10년이 지나서도 자신의 실력과 기억력이 그만큼 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평생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58년 필즈상을 수상한 르네 통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당시 수학자 알렉상드르 그로텐디크로 인해 전공을 포기한 케이스다. 그로텐디크는 더 이상 수학에서 해결할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천재였다. 통은 그로텐디크의 탁월함에 비춰 자신은 내세울 것이 없다며 과학인식론과 철학으로 진로를 바꿨다. 누군가 계산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는 꿈을 꾸고 새 영역을 개척하는 게 더욱 좋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물론 노력형 천재도 있다. 1970년 필즈상 수상자인 일본의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그런 경우다. 그는 비명문대를 재수해 들어간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수학 천재들을 볼 때마다 “난 바보니까 2~3배 더 노력해야겠다”며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난제들과 직접 부딪쳐 끈기로 해결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ICM)가 8월1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수학 천재 5000명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 필즈상 수상자도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애플이나 구글의 창조성 원천이 수학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시대다. 중고생들의 수학실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흥미도는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게 한국이다. 지금 히로나카처럼 꾸준하고 끈기있게 끌고가는 힘이 필요한 건 비단 수학분야만이 아닐 것이다.
오춘호 논설위원 ohchoo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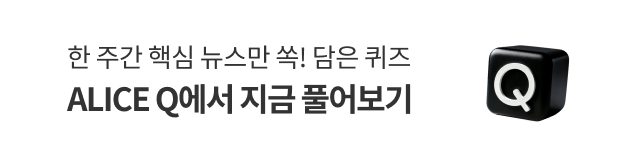
![[한경에세이] K컬처 날개 될 음악저작권 자산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7.42254928.3.jpg)
![[다산칼럼] 28년 전 위기 뒤엔 'NATO'](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7.21319847.3.jpg)
![[데스크 칼럼] 식자재 마트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7.3347240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