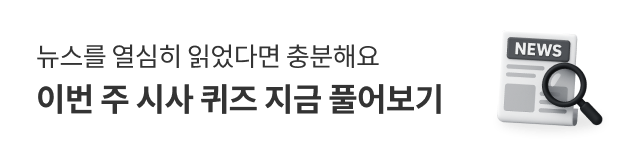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1) '피자 수출 강자' 고피자
푸드트럭서 출발한 임재원 대표
회전율 높이기 위해 '테크' 접목
7개 나라서 191개 매장 영업 중
200대 1 뚫고 창이공항 입점
싱가포르서 피자헛 수준 인지도
인도 '비건 피자'로 현지화 성공

“피자도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1인용 화덕피자로 피자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고피자의 임재원 대표(34)는 사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뒀다고 했다. 피자 소비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젊은 층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최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그래서 첫 해외 지점도 인도에 열었다”고 했다.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 중위연령이 28세에 불과해 피자 사업에 유리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피자 수출은 순항 중이다. 2017년 서울 대치동에 3.3㎡짜리 1호점을 낸 이후 국내외에 총 191개 매장을 열었는데 이 중 한국이 130개, 해외가 61개다. 해외 매장은 인도가 30개로 가장 많고 이어 싱가포르(23개), 인도네시아(4개), 홍콩(2개), 일본·말레이시아(각 1개) 순이다.
2020년 진출한 싱가포르에선 시장점유율이 피자헛과 도미노피자에 이어 3위다. 이달 말엔 세계 1위 공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에도 매장을 연다. 임 대표는 “200 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며 “공항 안에 맥도날드, 서브웨이, 던킨도넛 등 글로벌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데 매일 TV로만 보던 운동선수와 같이 뛰는 기분”이라고 했다.
임 대표는 ‘피자는 여러 명이 모여서 먹는 음식이고 화덕피자는 사람이 구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1인용 화덕피자를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고피자는 원래 임 대표가 2016년 푸드트럭에 붙였던 이름이다. 당시 회사원이던 그는 부업 삼아 좋아하는 피자를 주말마다 서울 여의도 야시장에서 팔았다. 그는 “처음엔 화덕 한 대로 피자를 굽다 보니 고객이 서너 시간 줄을 섰다”며 “나중엔 화덕을 세 대로 늘렸더니 인건비가 무섭게 증가했다”고 했다.
‘회전율을 높이면서 사람을 덜 쓰는 피자집을 차리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그는 기술을 이용하기로 했다. 초기에 받은 투자금으로 식품공학자와 로봇공학자를 고용했다고 한다. 피자 도우를 사람이 일일이 동그랗게 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반쯤 구워낸 뒤 냉동시킨 도우를 개발했다. 1인용 피자를 최대 여덟 판까지 한꺼번에 구울 수 있는 자체 오븐(고븐)도 개발했다.
도우에 토마토소스를 바르고 모짜렐라 치즈와 페퍼로니를 올린 뒤 컨베이어벨트형 오븐에 넣기만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끝난다. 오븐이 알아서 돌아가며 피자를 구워내고 오븐에서 나온 피자를 기계가 5등분으로 잘라낸다. 1인 피자 6~8판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가량이다.
1인용 피자 가격은 5900~9800원. 한 판에 2만~3만원 넘는 보통의 대형 피자보다 가격이 싸다. 임 대표는 “피자는 한 번 굽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크게 만들어 비싸게 팔아야 마진이 남는다는 기존 피자업계의 정설을 모두 깼다”고 했다. ‘피자의 판을 뒤집겠다’는 생각으로 피자 모양도 보통 피자 모양인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을 택했다.
매출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18년 13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200억원으로 4년 새 15배 늘었다. 특히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에서 도우를 만들어 해외 지사로 수출한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피자 식자재 판매를 통해 올리는 것이다.
해외 시장 공략 비결은 ‘철저한 현지화’다. 인도 시장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베지 피자’가 성공을 거뒀는데, 임 대표는 “현지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제작 지원=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