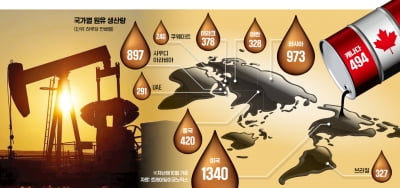러브버그는 짝짓기할 때 암수가 꼬리를 맞대고 비행하는 모습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최근 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발생한 것은 장맛비가 내린 이후 지난 주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숲속에 남아있던 개체군이 한꺼번에 우화했기 때문이라고 곤충학자들은 설명했다.
붉은등우단털파리는 개미가 혼인비행 하듯 떼로 날아다니는 경향이 있고 장애물 없이 탁 트인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백운대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붉은등우단털파리 생활사를 고려하면 다음 주 정도부터 개체수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붉은등우단털파리는 고향이 중국 남부와 대만인 외래종인데 201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작년 한국 수도권에서 관찰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유입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무역 등 국제교류 과정에서 유입됐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생물연구과 박선재 연구관은 "남쪽 지역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온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다"라며 "인천항과 김포공항 등에서 교역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등산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립공원공단은 살충제를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나 천적을 도입하는 생물학적 방제를 실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붉은등우단털파리를 잡으려고 뿌린 살충제가 다른 생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향후 살충제에 적응한 다른 곤충이 대발생할 위험도 있어서다.
그렇다고 천적을 타지에서 함부로 들여왔다가는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에서는 1935년 사탕수수를 먹는 딱정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도입된 중남미 출신 맹독성 양서류 '사탕수수두꺼비'로 인해 호주 민물 악어가 멸종위기에 내몰린 적 있다.
박 연구관은 "붉은등우단털파리는 밝은 색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화 시기 대발생 지역에 끈끈이트랩을 설치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천적을) 도입할 때는 사전에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해살이' 곤충인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유충일 때 흙바닥에서 낙엽과 유기물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지렁이처럼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익충으로 분류된다.

연구진은 서울이 붉은등우단털파리 서식 '북방한계'가 됐다면서 이는 북위 33도보다 남쪽 아열대에 살던 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온대지역으로 서식지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60∼1970년대 멕시코만 주변 북미에서 러브버그(플레키아 네악티카)가 서식지를 넓히고 대량 발생했을 때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레키아 네악티카는 원산지가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코스타리카로 이어지는 멕시코만 연안이었으나 1940년대 플로리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동쪽으로 서식지를 넓혔고 이후 1960~1970년대 해당 지역에서 대량 발생했다.
연구진은 "서울 붉은등우단털파리도 단시간에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하는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도시환경은 (붉은등우단털파리가) 더 집적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포토] 양자전략위원회 출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79452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