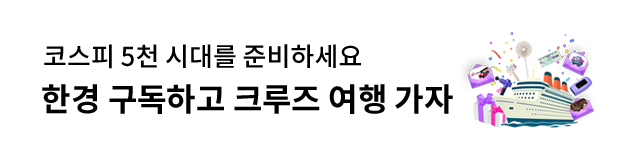6개월 전 A씨의 남편은 한 마디 상의 없이 강아지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강아지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A씨는 극구 반대했지만 남편은 본인이 다 책임지고 돌보겠다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강아지를 집에 들이게 된 A씨. 걱정과 달리 A씨의 남편은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배변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훈련도 도맡아 하는 등 열심히 강아지를 돌봤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언젠가부터 남편은 배변판도 치우지 않고, 밥이나 물도 챙겨주지 않았다.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알겠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뿐이었다. 책임감 없는 남편의 태도에 강아지를 돌보는 것은 오롯이 A씨의 몫이 됐다.
강아지는 아무 곳에서나 배변을 했고, 전선과 장판을 물어뜯는 등 끊임없이 사고를 치기도 했다. 그 덕에 A씨는 이불 빨래까지 해가며 모든 반려견 케어를 혼자 해야만 했다. 물론 강아지가 귀엽긴 했지만 A씨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할 정도의 애견인은 아니었다. 당초 남편의 반려견 사육 요구에 반기를 들었던 것 역시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퇴근을 해서도 쉬지 못하고 강아지가 사고친 것을 수습하려니 A씨는 점점 힘이 들고, 짜증나기 시작했다. A씨는 4개월 동안 계속 남편에게 "이럴거면 다른 집에 갖다주겠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행동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참고 또 참던 A씨는 결국 분노했다. 그는 남편 몰래 입양처를 알아보고, 강아지를 입양 보냈다. 이후 남편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A씨의 남편은 반려견을 키우게 됐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A씨도 보호자고 엄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아지의 대, 소변을 치우고 돌보는 것 역시 당연히 A씨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그럼 넌 왜 안했냐"고 물었고, 남편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상의도 없이 보내냐. 강아지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맞섰다.
다툼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분명히 키우기 전에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집에 보낼거라고 약속했고, 몇번이나 기회를 줬다. 근데 안지키고 손놓은 건 너다. 난 그래서 보낸거다"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생명을 버리냐. 걔는 엄마한테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실망이다"라며 A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A씨의 남편은 당장 강아지를 다시 데려오라고 했다. A씨는 정말 자신이 매정한 사람인 것인지, 자신이 추구하던 안락한 삶은 보장 받지 못한 채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가 아니라 남편을 입양 보내야 할 것 같다", "강아지를 돌보지 않는 남편은 절대 애견인이 아니다", "오히려 강아지의 행복을 위해 입양을 보낸 게 잘한 선택인 것 같다", "생명을 우습게 안 건 글쓴이가 아니라 남편이다", "데려왔으면 약속을 지켜야하는 거 아니냐", "강아지가 주는 귀여움은 느끼고 싶은데 그에 따른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방치도 학대다", "그래도 입양을 상의 없이 보낸 건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B금융그룹이 전국 성인 1700명을 설문조사해 발간한 '2018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25.1%는 '현재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답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길러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9.2%, '길러 본 경험이 없다'는 35.7%였다. 4가구 중 1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 고양이 양육가구의 85.6%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했고, 양육기간은 평균 8.9년이었다.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고양이(87.4%), 개(85.7%), 둘 다 양육(83.7%) 순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조8900억원 규모를 형성했다. 이른바 '펫코노미(pet+economy)' 시대가 도래한 것. 커지는 시장 규모에 비례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 또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와글와글]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나 어이없는 갑질 등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와글와글]에서 다룹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