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라 코하카 지음 / 윤태경 옮김
캐피털북스 / 496쪽│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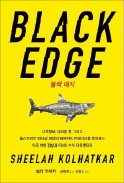
통화의 주인공은 헤지펀드인 갤리언그룹의 공동설립자이자 유명 트레이더인 라지 라자라트남과 또 다른 트레이더인 대니얼 치에이지였다. 그로부터 6일 후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인 아카마이테크놀로지는 다음 분기 이익이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가는 20% 넘게 떨어졌다. 두 사람은 공매도로 1주일 만에 700만달러 넘게 벌었다.
전직 헤지펀드 애널리스트이자 현직 ‘뉴요커’ 기자가 쓴 《블랙 에지(Black Edge)》는 월가에 만연한 내부자 거래 현장을 파고든다. 다른 투자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정보를 ‘에지’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블랙 에지’는 주가를 확실히 움직일 미공개 독점 정보를 의미한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실적이나 인수합병 제의에 대한 정보, 공개가 임박한 신약 임상시험 결과 같은 것이다. 저자가 ‘사이클에서의 도핑’이나 ‘프로야구에서의 스테로이드’에 비유할 만큼 블랙 에지의 유혹은 강력하다.
FBI가 도청으로 잡은 작은 실마리는 거대하게 얽힌 실뭉치의 일부였다. 실타래를 하나씩 풀 때마다 공통으로 나오는 회사가 있었다. ‘헤지펀드업계 최대 성공담의 주인공’인 스티븐 A 코언의 약자를 딴 헤지펀드 SAC캐피털이다. 코언은 1978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한 뒤 옵션 트레이더로 월가에 발을 들여놓았다.
하루 10만달러씩 벌어들이며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던 그는 1992년 2000만달러를 들여 SAC캐피털을 설립했다. 이후 20년간 연평균 30%의 기록적인 수익률을 냈다. 9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2008년 직원이 1200명으로 늘었다. 월가 트레이더들이 “코언은 모든 거래에서 늘 승리하는 쪽에 서 있다”고 말할 정도였지만 그 비결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FBI와 연방검찰. 증권거래위원회가 7년간 벌인 수사 끝에 SAC캐피털에는 18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 10명의 직원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저자는 수사 과정과 법정 공방을 집요하게 따라간다. 이 과정에서 3년간 취재하고 200명 넘는 관련자를 만났다. 수백 차례의 인터뷰에 재판 속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했고 선서 증언과 증권거래위원회 증언기록, FBI 조사 메모까지 들춰 책에 녹여냈다.
‘탐정소설 같은 다큐멘터리’라는 저자의 소개처럼 소설 못지않은 반전에 긴장이 가득하다. 증인을 포섭하는 FBI 요원,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친구를 밀고하는 젊은 트레이더, 직원들의 불법 거래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처벌은 피하려 편법을 쓰는 경영진까지. 적나라한 현실들은 차라리 소설 같다.
하지만 결론은 다소 허무한 현실로 돌아온다. 결정적인 물증 부족으로 코언은 법의 심판을 피해갔다. 이후 그는 SAC캐피털 대신 가족자산 관리회사 포인트72를 설립해 100억달러를 운용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껴보고 싶다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책마을] 음모론·엘도라도·종말론… 美는 왜 판타지에 빠졌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AA.17265337.3.jpg)
![[주목! 이 책] 소확행](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AA.17264897.3.jpg)
![[책마을] 좀비 영화 '부산행'에 왜 천만이 열광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AA.1726448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