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6년 11월1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박스 기사의 제목이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 “韓國經濟新聞社는 韓國新聞史上 최초로 오늘부터 퍼스널 컴퓨터와 단말기를 통해 經濟뉴스와 각종 生活經濟情報를 제공하는 ‘韓經 프레스텔’을 본격 가동, 전국에 무료로 서비스합니다. ‘韓經 프레스텔’은 韓國데이타通信株式會社의 公衆情報通信網(DACOM.NET)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電子미디어시대의 획기적인 새 章을 열게 됩니다.” 이날 신문은 전체 12면 가운데 4개 면(9~12면)을 할애해 한경 프레스텔의 기능과 PC통신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달했다.

한경 프레스텔은 이듬해 ‘한경 케텔(KETEL)’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 한국통신(현재 KT)에 인수되면서 1992년 ‘하이텔’이란 익숙한 명칭을 갖게 됐다.
하이텔은 1980년대 후반 서비스를 시작한 천리안과 함께 PC통신 업계를 이끌었다. 이 서비스들은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BBS(전자 게시판) 기능을 도입해 거대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1세대 격이다. 나우누리, 유니텔 등 후발주자들도 인기를 끌면서 PC통신은 1990년대 후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물론 이 서비스들은 현재 자취를 감췄거나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서비스들은 느린 네트워크 환경 탓에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VT(가상터미널) 모드를 사용했다. 2000년대 들어 초고속 유선통신망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컴퓨터 사양도 높아지면서 월드와이드웹(WWW), 즉 현재 사용 중인 인터넷이 자리를 대체했다. 기술의 발달로 기존 서비스가 도태된 대표적 사례다.
유선 통신망에서 무선 통신망으로 시장의 중심축이 바뀐 2010년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모바일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커뮤니티·SNS 서비스만이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고 있다. PC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예다.
◆10년 뒤에도 페이스북을 쓰고 있을까
잘못된 선택으로 사용자들에게 버림받은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이유도 제각각이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는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 첫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2000년대 초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포털 사이트 프리챌은 섣부른 유료화 정책이 발목을 잡았다. 이 사이트의 핵심 기능은 PC통신의 BBS 기능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커뮤니티였다. 1999년 서비스 시작 이후 단기간에 가입자 1000만명, 커뮤니티 100만개를 돌파했지만 사이트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프리챌 측에서 2002년 11월 유료화를 강행했다.
대부분 커뮤니티들이 다음 ‘카페’, 싸이월드 ‘클럽’ 등으로 둥지를 옮겼다. 특히 싸이월드는 프리챌 커뮤니티의 글을 통째로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봤다. 이 사건으로 프리챌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지난해 2월 커뮤니티 서비스를 최종 종료했다.
싸이월드는 프리챌 사용자를 거름 삼아 빠르게 성장했다. 클럽 이용자가 늘면서 이 사이트의 핵심 서비스인 폐쇄형 SNS ‘미니홈피’도 활성화됐다. ‘일촌’이라는 독특한 네트워크와 간편한 사용법 등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에는 35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했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이 가입한 셈이다. 하지만 시장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PC 플랫폼을 고집한 것이 화근이었다. 오랜 기간 미니홈피에 사진과 글을 올렸던 이용자들도 더 간편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로 옮겨갔다. 2011년 일어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이탈 속도를 높였다.
수많은 SNS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과정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사진 공유 중심의 인스타그램이 인기다. 지난 10월 기준 월간 이용자 수가 3억명으로 2억8400만명을 기록한 트위터를 앞섰다. 물론 최대 SNS는 월간 사용자 13억5000만명을 기록한 페이스북이다. 10년 뒤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얘기할지는 미지수지만 말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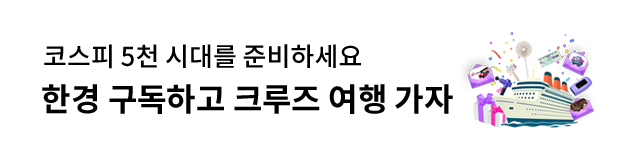
![[속보] "예규 통해 위헌심판 등 절차지연 없이 신속·공정재판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2.2257924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