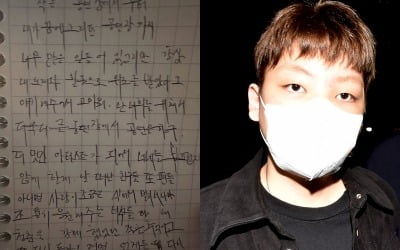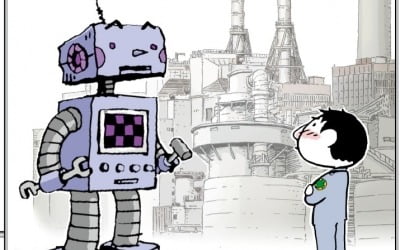서정문 <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연구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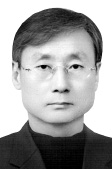
전하는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담양에 사는 김성일은 무과에 응시하러 서울에 가 있었다. 그런데 숙부 김세민의 노비 금이가 세민의 아내와 간통했다. 세민의 형이자 성일의 아버지인 준민은 금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를 알아챈 금이가 제 아버지와 동생을 데리고 도리어 밤에 준민을 습격해 참혹하게 살해했다. 인조 7년(1629년)의 일이다.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온 성일은 동생과 장사도 미루고 틈을 엿보다 저잣거리에서 노비 금이와 그 부모를 쳐 죽였다. 직접 목을 자르고 간을 도려내 식구를 시켜 빈전에 매달도록 하고는 자신은 그 즉시 관가로 가서 자수해 투옥됐다. 인조가 그 효성과 의리를 가상하게 여겨 특사했다.
송시열은 말한다. “김성일이 무부 출신으로 경전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원수를 갚았으니, 이는 복수설치(復雪恥)의 대의를 안 것이다. 더구나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장사조차 지내지 않은 채 원수를 찾아 저잣거리를 헤매었으니 이는 군부의 원수를 갚지 않고서는 장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복수설치의 대의를 실천한 것이다. 일개 무부로서 너무도 장한 일이며, 이는 복수설치의 큰 의리가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원수의 손에 죽었는데도 복수의 대의를 밝히지 못했다면, 아무리 후하게 장사를 치렀더라도 실상은 군부의 시신을 시궁창에 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ADVERTISEMENT
임진왜란 때 왕릉이 파헤쳐지고 왕의 시신이 왜군에 의해 훼손된 이후 복수는 중요한 이슈가 됐고, 적개심을 통해 민심을 규합했다. 왜란이 난 지 정확하게 44년 만에 호란이 났고, 이번엔 아예 왕이 머리를 아홉 번 땅에 콩콩 찧는 굴욕을 목도했다. 조정의 자존감은 찢어지고 왕실의 권위도 무너졌다. 복수를 외치며 적개심을 충절로 포장하는 것은 왕조의 당연한 선택이었으며, 그를 통해 요동치는 민심을 잡아 둘 수 있었다. 하지만 복수심을 고조시킬수록 필연적으로 열패감은 더욱 깊어지고 내재화되며, 마침내는 역사의 트라우마가 된다.
스포츠에서조차 역사와 민족을 외치며, 자존감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사회적 열병을 앓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복수설치를 외치는 왕조적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서정문 <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