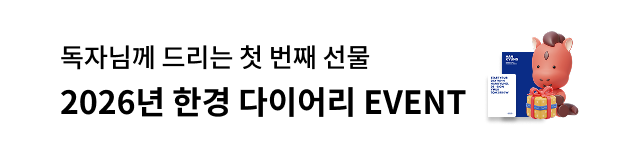취업 사후관리 없어
직장 1년만 버티면 500만원…이직 부추기는 인센티브
취업프로그램 넘치지만
진도 못 따라가 포기 속출…민간 위탁단체 교육내용 부실
○수급권 특례·취업 인센티브 충돌
정부는 2005년 새터민에 대한 정착 지원 방식을 대폭 수술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비 등 정착지원금을 359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대신 취업교육을 받거나 직장생활을 하면 그 시간에 비례해 최고 2440만원의 정착장려금을 주기 시작했다. 자립 의지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취업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성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따르면 탈북자 실업률은 2008년 9.5%에서 2010년 9.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2.1%로 다시 높아졌다.
정부의 취업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고용 성적이 저조한 건 새터민이 힘들게 일해 자립하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보호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새터민의 90%가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릴 정도로 이들의 소득 수준은 낮다.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도 33%나 된다. 이들이 기초생활자가 되면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만 해도 2인 가족은 74만원, 4인은 1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속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식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새터민 김모씨(37)는 “한 직장에서 6개월 일하면 250만원, 1년 일하면 500만원의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그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센티브식 지원 방식이 1~2년 단위의 ‘메뚜기 취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화선 이화여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새터민들에게는 장기근속보다는 지원금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며 “두 제도가 충돌하면서 정부의 취업 인센티브제의 실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터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이원화돼 있다.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배움카드제’ 등 기존의 취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새터민에게 초기 직업교육 기회를 주거나 취업을 알선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취업알선과 함께 창업·영농 등 새터민에게 특화된 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이 같은 취업 프로그램 가운데 정작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은 그리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컴퓨터 활용, 중장비 운전, 이·미용 기술 등 대부분의 취업 프로그램은 한국인 구직자들과 함께 석 달간 받도록 돼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에 들어온 김철호 씨(가명·28)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컴퓨터 교육을 받는데 진도가 너무 빨라 중간부터는 포기하고 딴청만 피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사전 취업 알선에만 치우친 것도 새터민들에겐 불만이다. 새터민들은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조직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취업을 하고나면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받을 곳이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새터민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이 채 안 된다.
○민간단체, 돈으로 유인
정부로부터 새터민 취업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잘못된 관행도 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새터민의 정착을 돕는 민간단체는 2007년 70여개에서 지난해 100여개로 급증했다. 정부 공모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민간단체들은 새터민을 확보하기 위해 돈으로 그들을 유인하기도 한다. 1997년 탈북한 임지수 씨(가명)는 “취업박람회 같은 탈북자 행사에 참석하면 쌀 한 가마니를 주거나 몇 만원씩 준다고 홀리는 데가 많았다”고 말했다. 취업 프로그램의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새터민 조진호 씨(가명)는 “민간단체의 경제 교육은 먼저 탈북한 새터민이나 종교인 등이 조언을 해주는 정도”라며 “그나마도 수업시간에 정부나 민간단체의 일회성 행사에 동원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서보미/윤희은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