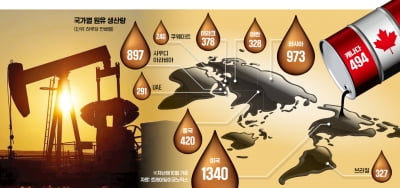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는 '위축효과'로 번역된다.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말이 주로 쓰이는 대상은 기자들이다.
취재원이 거액의 소송을 내겠다며 겁을 줄 때 이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겁을 주는 곳이 정치권력이면 기자들은 써야 할 글을 못쓰고 할 말을 못한다.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정치인 정당 사정기관 등이 기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무더기로 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이 낸 소송은 대부분 명예회복보다 기자에게 겁을 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 정부가 갓 출범한 이 때에 새삼 '칠링 이펙트'를 얘기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이 현상이 경제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권이 시작될 때마다 경제인을 잡아넣는 사정 한파가 불긴 했지만 이번에는 위축효과를 느낄 정도로 강도가 세다는게 재계의 인식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구속되고 손길승 전경련 회장과 한화그룹에 대한 추가수사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할 일(투자)을 하고 할 말(정부건의)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재계는 두산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무상소각을 위축효과가 나타난 전형적인 예로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을 위한 고심어린 결정이라는 두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겁을 먹은 결과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최태원 SK㈜ 회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두산이 알아서 백기를 들었다는 얘기다.
재계는 삼성이 국세심판원의 이재용씨에 대한 증여세 패소 결정을 법원에 가져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심판원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엄연한 법적 권리인데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에 "나의 어디가 불안하냐"고 재계 인사들에게 물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
'오해하지 말라'는 뜻일 게다.
그런데도 재계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위축효과는 원래 주는 사람은 느끼기 힘들다.
혹시 참여정부가 주는 공격적 이미지 때문은 아닌지 생각할 때다.
고기완 산업부 생활경제팀 기자 dadad@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