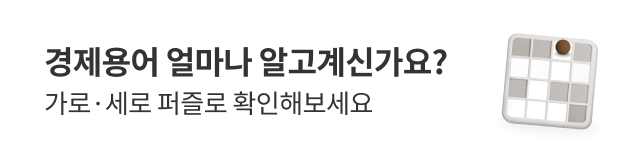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큰 역할
1976년 일본 유학갔다가 첫 인연
주한 프랑스대사관서도 근무

법무부에서 특별귀화를 허가받은 마르틴 프로스트 박사(64·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프로스트 박사에게 특별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정부가 심사를 통해 국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프로스트 박사는 프랑스에서 지식인을 규합해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하도록 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한국 문화를 유럽에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프로스트 박사와 한국의 인연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했다. 그는 1974년 프랑스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갔다. 유럽에서는 인접 국가끼리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과 달리 일본에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국에 대한 소식을 거의 들을 수 없어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1976년 한국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곧 한국의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이후 한국 문화를 깊이 공부해 1984~2011년 프랑스 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 교수와 학과장을 지냈다.
프로스트 박사는 1992~1996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문화정책담당관으로 일하며 “프랑스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하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3년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고속철도 사업 관계로 방한했습니다. 도서 중 한 권을 돌려주며 전체 반환을 약속했지만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죠. 한국 사람들이 섭섭해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프로스트 박사는 이후 프랑스 지식인들을 규합해 외규장각의궤반환지지협회를 구성하고 프랑스 언론에 반환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프로스트 박사는 “계속 한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반은 한국인이 됐다. 한국 국민이 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을 꾸준히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