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학고재갤러리

서울 소격동 학고재갤러리에서 오세열 화백(76)의 개인전 ‘은유의 섬’이 열리고 있다. 오 화백의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회화 24점을 소개하는 전시다. 1945년 해방된 해 태어난 오 화백은 유년기를 전쟁의 폐허에서 보냈다. 하루 중 가장 소중한 건 그림 그리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그림 속 숫자와 기호가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무 데나 직직 그리듯이, 그때그때 낙서하듯이 그리는 겁니다. 굳이 의미를 말하자면 우리 삶에서 떨쳐내려야 떨쳐낼 수 없는 숫자들을 담았다고나 할까요. 사람 그림도 여러 사람에 대한 인상만 갖고 그리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나도 내 그림을 보고 가끔 ‘잘 못 그렸네’ 하고 웃어요. 애초에 잘 그릴 생각도 없습니다.”
낙서하듯 그린다지만 쉽게 그린 그림은 아니다. 먼저 캔버스에 무수한 붓질로 물감층을 쌓아 칠판이나 벽면 같은 색과 질감을 만든다. 이후 못이나 면도날처럼 뾰족한 도구로 화면을 긁어내 꽃과 새, 창문 등을 그린다. 길 가다 주운 일상의 오브제도 붙인다.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함께 주는 빨간색 플라스틱 칼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일상의 장면과 잡동사니가 층을 이룬 두꺼운 단색조 물감을 배경으로 뒤섞인다. 조형의 변화와 리듬, 비례와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캔버스를 내 몸이라고 생각해요. 화면을 긁어내면서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아픔과 슬픔, 그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겁다. 작품 가격이 1억원 안팎에 달하지만 찾는 사람이 많다. 전시장 입구에 걸린 ‘무제’는 전시 첫날 판매된 뒤에도 구입 문의가 쏟아진다고 한다. 오 화백의 작품에서 치유와 위로를 얻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유년의 순수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표현했다. 아이들이 손이 가는 대로 끄적인 낙서가 그렇듯, 그의 작품도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전시는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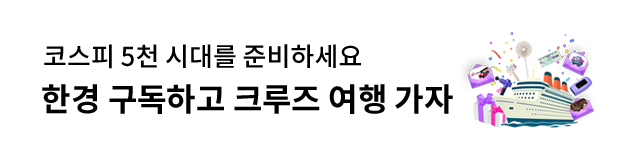

![[그림이 있는 아침] 여성주의 미술 대모의 얼굴…윤석남 '자화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AA.2563610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