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톤 체호프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1899)

구로프는 S시로 가 오페라 극장에서 안나를 발견한다. 이후 안나는 남편을 기만하고 모스크바로 향한다. 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밀회를 즐기게 된다. 구로프는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는 한편 이런 자신을 사랑하는 안나에 더욱 진실한 감정을 느낀다. 구로프는 세상으로부터 숨어야 하는 처지를 괴로워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기에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든 더 나아지리라 기대한다.

‘관례적 진실과 관례적 기만’으로 가득 찬 ‘공공연한 삶’과 ‘비밀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이중생활을 별 갈등 없이 해나가던 구로프는 ‘별 볼 일 없는’ 한 존재가 자기 삶 전체를 채우는 경험을 비로소 하게 된 것일까? 이로써 그(와 안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인가? 구로프의 내면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불륜 사건은 배경이 되지만 주인공의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문득문득 전면에 드러난다. 두 사람이 얄타에서 만나 이전과는 달라질 순간을 어렴풋이 예감하는 즈음 체호프는 우리 앞에 밀려드는 파도 소리와 함께 인상적인 풍경을 던져놓는다.
“오레안다에서 그들은 교회 근처 벤치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얄타는 새벽안개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고, 산꼭대기에는 흰 구름이 꼼짝도 하지 않고 걸려 있었다. 나뭇잎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매미들은 울어댔으며 아래에서 들려오는 단조롭고 아득한 바닷소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안식과 영원한 잠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다. 얄타도 오레안다도 없던 때에도 저 밑에서는 바다가 그렇게 울렸을 것이고 지금도 울리고 있으며, 훗날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무심하고 아득하게 울릴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 영속성 속에, 우리의 개별적 삶과 죽음에 관한, 이 완전한 무관심 속에, 인간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상의 삶과 끊임없는 완성에 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체호프의 중편 <지루한 이야기>(1889)의 주인공인 노학자 니콜라이는 평생 과학에 헌신했고 교육에 매진했으며 가정에 충실했던, 사회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가 죽음을 몇 달 앞두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의 삶에 ‘공통 사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통 사상이란 파편화된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우주와 나를,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편 <검은 옷의 수도사>(1894)에서 정신병으로 파멸해 가는 문학박사 코브린을 그린 작가는 이 작품이 ‘의학적인 소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의도와 지향과는 관계없이 ‘다른’ 세계를 비춘다. 체호프 자신이 ‘공통 사상’을 추구한 작가는 아니었으나 <지루한 이야기>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하게 되듯, 작가가 단순히 병든 인간을 그린 것이고 과대망상증 환자를 상정했다고 해도 그는 그 너머 세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코브린이 원했던 무언가 ‘거대한 것, 무한한 것, 영혼을 뒤흔드는 것’은 정신병자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통 사상’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육체를 유지하지 못해 죽어가는 코브린을 그리는 체호프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주인공이 죽음에 이른) ‘영원한 진리, 공동의 선’이 무가치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진리로 인해 삶은 의미를 획득하나 그것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진정한 관계로 인해 환희를 맛보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다. 다른 존재와의 진정한(또는 그렇다고 여겨지는) 만남을 통해 발생하는 생의 충만감은 반복되는 일상의 허무감에 대비된다. 여기에는 자신을 넘어선다는 측면이 있다. 이야기는 주인공들의 선택이 열려 있는 채로 끝난다. 이제 그는 시간을 상대해야 한다. 체호프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 이삭 레비탄의 그림은 놀랍게도 구로프가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던 오레안다의 풍경을 생생히 보여주는 듯한데, “안식과 영원한 잠”을 향해 노 저어 가는 지상의 “끊임없는 운동”은 그래서 처연하기도, 숭고하기도 하다.
서정 에세이스트•번역가


![보라 저 ‘발가벗은 힘’을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19955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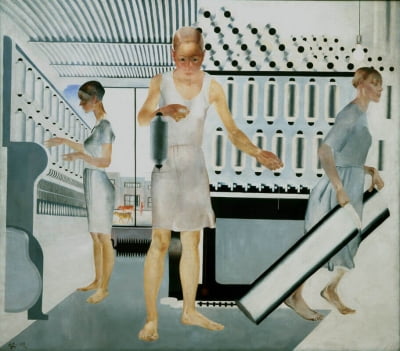
![미국 재무부가 특공대처럼 써대는 종이, 달러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18707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