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사장은 “이번 밸런타인데이는 역대급으로 공쳤다”며 “그때 주문했던 초콜릿 재고를 아직 다 처리하지도 못했다. 이제 기념일이나 데이 특수는 사라진 것 같아 기대를 접었다”고 푸념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밸런타인데이(2월 14일)와 화이트데이(3월 14일)를 겨냥해 유통업체들이 각종 기념일 관련 제품들을 앞다투어 내놓지만 정작 현장에선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이 기념일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유통업계가 판매 증진을 위해 애용하던 ‘OODay’ 마케팅도 약발이 다했다는 것이다.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고물가로 침체됐던 소비를 겨냥해 각종 프로모션 상품이 나오지만 현장에선 심드렁한 반응이다. 5일 만난 편의점 점주들은 더이상 ‘기념일 특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밸런타인데이 특수를 기대했지만 대부분 매출 증대 효과가 미미했다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매장 밖까지 줄을 서서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선물을 사가는 건 이제 옛말”이라며 “손님 자체가 준 데다가 요즘은 워낙 기념일용 상품이나 이벤트가 다양해 양산품을 잘 사가지 않는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편의점에서 인형이나 꽃다발을 누가 사가겠냐”고 했다. 인근 또 다른 편의점 가맹점주 C씨도 “주변에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사장들이 빼빼로데이부터 밸런타이데이까지 각종 행사 상품을 대량 발주했다가 죄다 낭패를 봤다”며 “초콜릿은 유통기한도 짧아 내버린 양이 상당하다. 손해만 봤다”고 털어놨다.

소비자들도 기념일을 겨냥하는 일명 ‘데이 마케팅’이 효력을 다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양모 씨(29)는 “기념일이라고 평소 잘 사지도 않는 초콜릿이나 사탕, 꽃다발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상술에 휘둘리는 것 같아 연인과 협의해 굳이 하지 않기로 했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캠핑을 가 질 좋은 소고기를 구워 먹을까 아니면 평소 가고 싶었던 식당을 예약해 식사를 할까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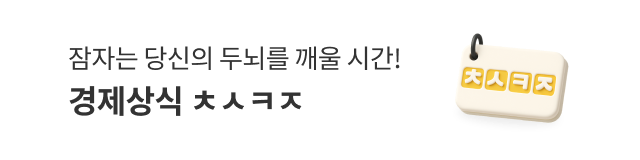

![[포토] 한국경제신문 대학생 서포터즈 5기 발대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77873.3.jpg)
![서울 서초구 전자게시대 광고요금 5분의 1로…'1만원에 10일'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4555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