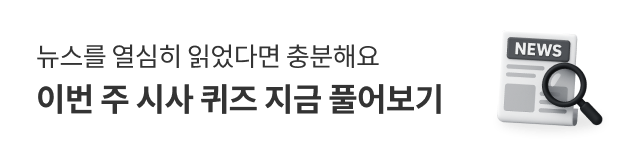9일(현지시간) 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제100회 PGA 챔피언십 1라운드에 나란히 출전한 두 선수에게 대회 의미는 특별하다. ‘명예 회복’이란 공통의 숙제를 해결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즈는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이 대회에 출전해 설욕을 별렀다. 양용은도 2009년의 ‘대역전 드라마’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둘은 결승에서 만날 기회를 좀체 잡지 못했다. 둘 다 본선에 진출한 게 2012년 딱 한 번이었을 만큼 조우가 쉽지 않았다. 그해에도 양용은이 5오버파로 4라운드에 나섰고, 우즈는 2언더파로 우승 경쟁을 하면서 마지막 날 한 조로 묶이지 못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은 우즈가 허리 부상에 허덕이며 PGA 대회에 아예 출전하지 못했다. 양용은도 2년 연속 커트 탈락했다.
올해 3년 만의 조우 기회를 잡은 ‘타이거와 킬러’는 그러나 1라운드에서 나란히 부진해 ‘어게인 2009년’의 구도를 연출하긴 힘들어졌다. 시작부터 끝까지 명암이 엇갈렸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 힘들어하던 우즈가 첫 두 개 홀을 각각 보기, 더블보기로 휘청거린 데 반해 양용은은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렸다. 양용은은 다섯 번째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해 한때 공동 2위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다.
후반부턴 상황이 반대로 변했다. 전반을 2오버파로 마친 우즈가 버디 2개를 후반에 따내면서 이븐파 공동 48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대회를 끝낸 반면 양용은은 더블보기 1개, 보기 3개, 버디 1개로 4타를 잃었다. 3오버파 공동 100위다. 둘 다 커트 통과부터 걱정할 처지가 된 셈이다.
우즈는 “더운 게 문제다. 땀이 많이 나 체중 유지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우즈는 대회장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벨러리브 컨트리클럽(파70·7316야드)에서 정식 경기를 치른 것도 처음이다. “부활한 우즈처럼 PGA투어에 다시 복귀하고 싶다”며 도전장을 낸 양용은도 마찬가지로 코스가 처음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