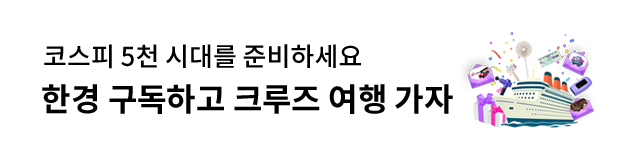클럽 열어놓고 그립 잡아야…무릎 낮추고 두 발은 고정
공은 왼발 뒤꿈치에 둬야 찍어 치면 모래에 박혀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한 클럽 길게 잡고 공부터 맞혀야 '굿샷'

공 3㎝ 뒷부분 겨냥하라

핀 가까이 공을 보내기 위해선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두 발을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린 채 무릎을 낮춰 고정해야 한다. 클럽은 짧게 잡는다. 중심은 왼발에 두고 공은 왼발 뒤꿈치 부분에 오도록 해야 한다. 이는 드라이버 샷을 할 때의 공 위치와 비슷하다. 김 프로는 “공을 오른쪽에 두고 샷을 하면 클럽 페이스가 채 눕기 전에 공을 맞힌다”며 “이 때문에 공을 띄우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샷을 할 때는 모래를 2~3㎝ 두께로 떠낸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뒤땅을 치면 된다. 뒤땅을 치는 지점은 공 3㎝ 뒷부분이다. 반드시 뒤땅을 쳐야 한다. 찍어서 치면 모래만 튈 뿐 공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김 프로는 “찍어 치면 클럽이 모래에 박히기 때문에 공을 띄울 수 없다”며 “자신 있게 뒤땅을 쳐서 모래를 떠내라”고 당부했다.
페어웨이 벙커는 평소처럼

한 클럽 길게 잡았으니 스윙도 부드럽게 하면 된다. 두 발로 모래를 파고 들어가 스탠스를 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 뒤땅을 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이 모래를 파고 들어간 만큼 클럽을 약간 짧게 잡는 것도 요령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