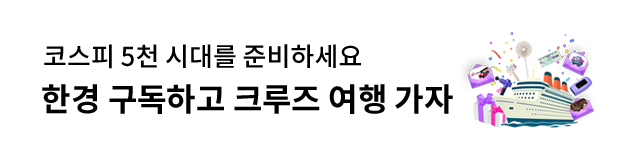친선골프 → 자선골프로…암센터에 5천만원 기부
"골프장은 인생면접장"

구력 25년의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62)는 ‘골프 행복론’을 강조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을 거쳐 지난 4월까지 중앙공무원연수원장을 지낸 윤 교수를 8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만났다. 그는 “골프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바꾸려면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저는 친선골프의 ‘친’이라는 글자를 ‘자’로 바꿔 ‘자선골프’를 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니 그 일부라도 갚아야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즐기는 운동’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 교수는 자신의 골프 행복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들과 8년 동안 열어온 골프대회를 자선대회로 치르고 있는 것. 대회 참가자들끼리 상을 주고받기보다 그 돈을 보람있게 쓰자는 뜻에서다.
지난해에는 5000만원가량을 걷어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에 기부했다. 윤 교수는 “전국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버디할 때마다 기부한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해본다”고 했다.
윤 교수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자문하는 정보전략연구소를 운영하던 1988년 기업인과 소통하기 위해 처음 골프채를 잡았다. 평균 스코어는 80타 정도, 베스트스코어는 이븐파다. 7년여 동안 신문과 잡지 등에 골프 칼럼을 기고했고, 골프방송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2010년엔 한국골프칼럼니스트협회가 주는 최우수 칼럼니스트상을 받을 정도로 골프는 윤 교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골프는 절정의 기쁨과 절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 중독성이 있는 운동입니다. 18홀을 돌면서 칩샷으로 버디를 성공시켰을 땐 환호하지만 벙커샷을 그린 뒤로 날려버렸을 땐 절망을 느끼기도 하죠. 각본 없는 드라마를 선사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고요.”
골프의 이런 매력에 푹 빠져 살아온 윤 교수는 골프의 가치를 만남과 소통에서 찾았다. 그는 “대여섯 시간을 함께 운동하다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된다”며 “골프장이 바로 인생의 면접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기업 경영철학과 골프 매너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며 “총장 시절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1200여명인데 평소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분들은 확실히 룰을 지키고 멀리건도 안 받더라”고 했다.
윤 교수에게 골프는 ‘도전’이다. 윤 교수는 58세이던 2009년 6월 군산CC에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72홀을 도는 기록에 도전했다. 120여명이 도전해 기네스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