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업계에 구전되고 있는 얘기다.
창업초기 5년내 자리를 잡느냐 못잡느냐에 따라 기업 흥망이 좌우되더라는
경험칙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다.
여기서의 "벽"이란 물론 판로확보 여부를 뜻한다.
하지만 이런 경험칙은 업종.국적을 가릴 것없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모양
이다.
미 벤처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 "Inc."는 매년 "미국의 고소득 스몰
비즈니스 1백사랭킹"을 조사해 게재하고 있다.
그런데 "1백대"에 이름이 올랐던 창업기업의 30%가 설립후 1년이내에
사라지고, 그후 2년이 지나면 또 20%를 넘는 기업이 모습을 감춘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결국 뉴 비즈니스의 절반이상이 다섯번째 생일상을 차려먹지 못한다는
얘기다.
물론 "선진국도 마찬가지더라"며 기계분야 창업기업들의 싹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한국 기계산업의 아킬레스건이 중소기업형 부품.기자재의 취약함에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대대적인 육성책을 들고나온 것도 이런 상황의 중요성
을 절감해서일 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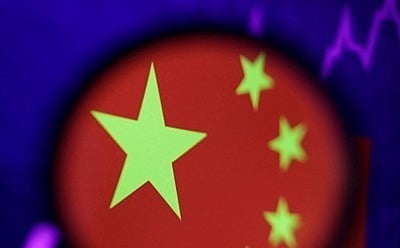
!["닭 직접 키우세요" 달걀 대란에 난리난 美…한국 상황 보니 [이광식의 한입물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2560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