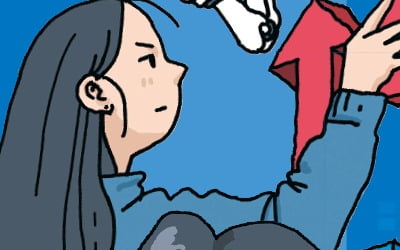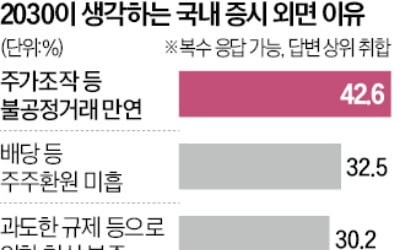3년에 걸쳐 줄곧 하락하는 주가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비부도기업은 상장직후 주가가 급등했다가 약2년후 바닥을
친 뒤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증권업협회 부설 증권경제연구원이 90~93년사이에 상장된
기업중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42개기업에서 34개기업을 대상
으로 기업특성,초기수익률,상장후 주가형태를 조사,분석해 12일 발표한
"부도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부도기업의 상장기간은 평균33개월에 불과 상장전부터
부도가 날 수 있는 취약성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모주를 사는 것이 상장직후 신규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 손실의 위험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도기업의 특성으로는 첫째 같은시기에 상장된 비부도기업에 비해
발행가격이 낮고 공모규모나 총자산규모도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가격의 경우 부도기업은 평균 9천3백97원이고 비부도기업은
1만1천5백17원이었다.
공모규모도 부도기업은 평균31억원이었던데 비해 비부도기업은 1백69억원
규모였다.
상장직전년도의 경상이익이나 순이익,매출액면에서도 부도기업은
비부도기업에 비해 열세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자산중 장기적인 고정부채비율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부도기업은 단기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장시점까지의 회사연령을 보면 부도기업이 비부도기업에 비해
훨씬 짧아 모험기업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도기업의 평균설립연수는 14년정도이고 비부도기업은 19년이
넘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장범식박사는 "투자자들이 공모주청약을 돈방석으로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증권사의 인수심사능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박사는 이와함께 부도가능기업의 공개를 주선한 증권사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