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가치 있는 산업유산 14곳 박물관 등 문화시설로 탈바꿈

부동산 개발회사가 탄광 땅을 사들여 완전히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이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일. 그러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개발에 반대하고 나섰다. 촐퍼라인 단지의 많은 건물이 ‘산업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한 시대를 대표했던 역사의 현장을 없애버려선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정부의 계속된 노력으로 15년 후 이 탄광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12번 수직갱도 안쪽 보일러실을 개조한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 등 많은 문화시설을 세웠고 지금은 탄광 전체가 건축, 산업디자인, 광고, 마케팅, 대학 등이 어우러진 창조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물론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자. 1892년 오스트리아 빈은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 외곽에 네 동짜리 대규모 가스 저장고를 세웠다. 폭 70m, 높이 80m에 달하는 네 개의 원통형 가스 저장고는 에너지가 천연가스로 대체되면서 1986년 완전히 문을 닫았다. 촐퍼라인 탄광 사례와 마찬가지로 빈시는 이들 가스 저장고를 ‘보존 건물’로 지정했다. 시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했지만 시측은 “도시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존하는 것이 옳다. 이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여의치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설득했다.
놀랍게도 현재 이 가스 저장고 네 동은 전체 615가구와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76실, 공연장 극장 쇼핑센터가 함께 들어선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신해 있다. 물론 외관은 그대로다. 도시 속의 작은 도시인 ‘가소메터(가스 저장고) 시티’가 탄생한 것이다. 시민의식이 높다는 유럽 사람들도 꺼리는 혐오시설마저 산업유산으로 보호하려는 빈시의 사회적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프로젝트였다.
책에는 이 밖에도 탄약공장을 미디어아트 중심지로 변모시킨 독일의 카를스루에,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꾼 스페인의 마드리드 등 14가지 사례가 담겨 있다. 저자는 이들 사례에는 전통과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존중’과 ‘인내’, 그리고 ‘양보’의 가치가 스며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아갈 도시는 과연 어떤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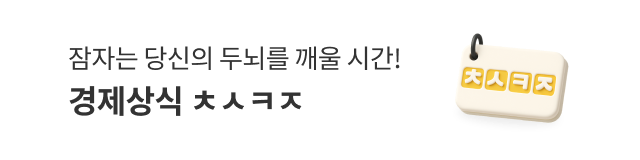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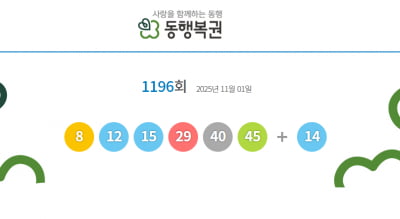
![[내일 날씨] 낮부터 추워져…강한 바람에 체감온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ZN.4222057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