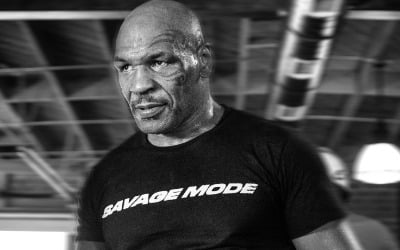성인 되고 심장 초음파 검사 실시해야
"격렬한 운동 위험…뇌경색 위험성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 매체는 영국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조노 스테드(27)가 심장 질환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14일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연은 영국 심장 돌연사 자선단체 '청년의 심장 위험(CRY)'이 이 남성의 부모님과 함께 심장질환 환자를 돕는 추모기금을 마련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남성은 사망 당일까지 별다른 증상 없이 평범한 하루를 보냈으며, 어머니와 대화를 마치고 낮잠을 자겠다며 집으로 돌아갔다가 불과 45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의 부모는 "조노는 항상 건강해 보였고 숨지기 직전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건강 상태가 좋아 보였다"고 했다.
그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증(HCM)' 때문으로 밝혀졌다. 비후성 심근증은 불필요한 심장 근육이 과도하게 두꺼워지면서, 정상적 심장 구조와 기능을 방해하고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능력을 저하하는 유전적 심장병을 말한다. 이는 전체 인구 5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심장 질환에 해당한다.
비후성 심근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운동 시 호흡곤란, 발작성 호흡 곤란, 피로감, 어지럼증, 두근거림 등이 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길이 순식간에 막히면 호흡곤란이 오거나, 돌연사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는 데다, 비후성 심근증을 앓는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생활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심장 재단에는 영국에서 매주 35세 미만의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 12명이 이전에 진단되지 않은 비후성 심근증으로 돌연사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이 중 80%가 징후나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사망자 중 젊은 사람들이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해당 질환으로 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유전 질환에 해당하는 비후성 심근증에 대한 사전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후성 심근증을 앓는 부모의 자녀는 20~30대가 됐을 때 심장 초음파를 진행해 유전 진행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부모가 해당 질환을 앓는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운동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급사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저염식이 심부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정근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 맥이 빨라지면 오기 때문에 심장 맥 조절하는 약을 사용하거나, 부정맥 있을 때 뇌경색을 예방하는 약물치료 쓸 수 있다"며 "심장 근육 두꺼워지는 것을 자르는 수술이나 기계삽입 치료, 심장 이식 수술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아직 이 질환에 대한 뾰족한 약물 치료는 없지만, 최근에는 관련 약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증상으로 있다가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격렬히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심장 맥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탈수했을 때를 주의해야 한다. 운동을 격렬히 하는 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며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 심장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맥이 빨라질 때 숨이 찰 수 있다. 병이 발현하는 과정에서 부정맥 등이 생기면 뇌경색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맛집 찾아다니던 20대…병원 갔더니 '날벼락'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99.352151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