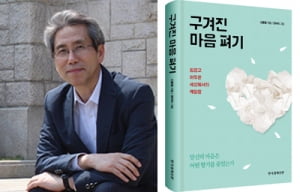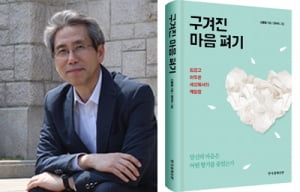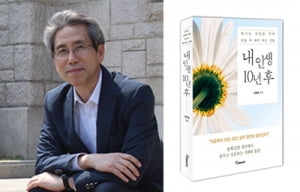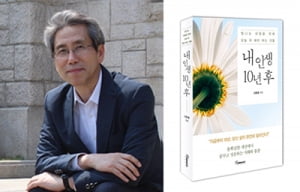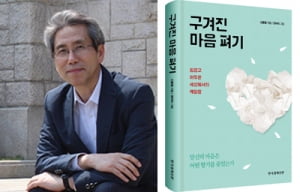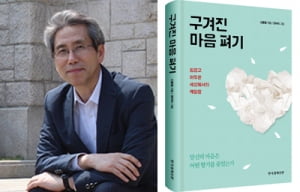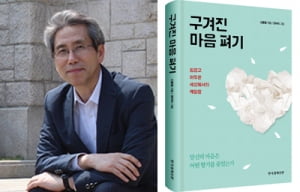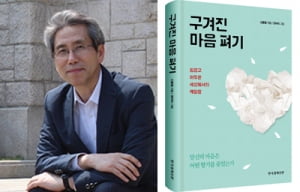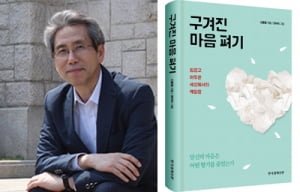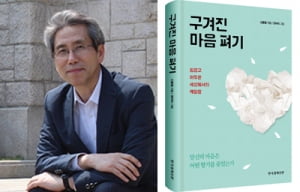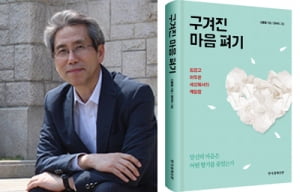-
우직지계(迂直之計)-때론 돌아가는 게 더 빠르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고, 비움이 채움보다 행복하다. 양보하는 자가 앞서가고, 힘을 빼야 공이 멀리 나간다. 정언약반(正言若反), 바른말은 반대인 듯하다. 특히 노자는 정언약반 기법을 즐겨 썼다. 공을 세우고도 이름을 갖지 않고, 만물을 작동하고도 주인이 되지 않는다. 빛나도 눈부시지 않고, 곧아도 방자하지 않는다. 도(道)는 작고도 크다. 스스로 작아져야 진짜 커진다. 성인이 위대한 것은 스스로 위대해지려 않기 때문이다…. ≪도덕경≫에는 정...
-
우산지목(牛山之木)-인간의 선한 본성은 어디로 갔을까
세월이 참 무섭다. 가슴 아린 아픔도 세월로 무뎌지고, 가슴 그득한 추억도 세월로 흐려진다. 그러다 어느새 까마득해진다. 뭔가를 잃는 순간은 안타깝지만 그 또한 세월이 흐르면 그게 원래 내것인지조차 아리송하다. 인간은 그렇게 뭔가를 잃어가며, 또 잊어가며 산다. 맹자는 본래 인간의 심성이 선하다고 믿었다.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인의예지의 단초다. 인간은 사단(四端)을 품고 있기에...
-
옥석혼효(玉石混淆)-만물은 옥과 돌이 섞여 있다
뒤섞이면 고르기 어렵다. 선악이 뒤섞이면 둘의 구별이 쉽지 않고, 대소(大小)가 뒤섞이면 덩치의 기준이 모호하다. 털자고 하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덮자고 하면 곱지 않은 사람이 없다. 만물은 옥과 돌이 섞여 있다. 한데 옥과 돌이란 게 때론 경계가 애매하다. 나에게 옥이 되는 게 누군가에겐 돌, 심지어 티가 된다. 그러니 세상을 당신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라. 동진(東晉) 시대 갈홍은 도가 계열의 사상가다. 그의 ≪포박자≫는 도교가 하나의 사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저술이다. 그는 이 책 ‘상박편’에서 배움의 도(道)를 이렇게 적고 있다. “≪시경≫이나 ≪서경≫이 도의(道義)의 큰 바다라면, 제자백가의 글은 이것을 보충하는 냇물이다. 방법이 다를지언정 덕을 닦는 데 무슨 다름이 있겠는가. 옛사람들은 재능 얻는 게 어렵다고 탄식했지만, 곤륜산 옥이 아니라고 야광주를 버리거나 성인의 글이 아니라고 수양에 도움 되는 말을 버리지 않았다. 한나라와 위나라 이후로도 ‘본받을 만한 좋은 말(嘉言)’이 많이 나왔지만, 식견이 좁은 사람들은 자구(字句)에만 매달려 오묘한 이치를 가벼이 한다.” 갈홍은 큰 것에만 매달려 정작 작은 것에 담긴 뜻을 소홀히 하는 세태를 나무란다. ≪시경≫이나 제자백가들의 가르침이 근본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세속의 크기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꾸짖는다. 이어지는 말도 함의가 같다. “뿐만 아니다. ‘작은 길(小道)’이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고, 너무 넓고 깊어서 머리를 혼란시킨다고도 한다. 티끌이 쌓여 태산이 되고 색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룬다는 걸 모른다. 천박한 시부(詩賦)를 감상하고, 뜻이 깊
-
어부지리(漁父之利)-이익은 서로가 노린다
작은 이익을 좇다 큰 이익을 놓친다. 그게 인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정의했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보다 이익에 더 자극받는다. 이익에 울고 우는 게 인간이다. 인간은 큰 이익을 등에 지고 남의 작은 이익을 노려본다. 누군가 뒤에서 그 큰 이익을 채가려는 걸 모르는 채 말이다. 전국시대 조나라 혜문왕이 연나라를 치려 했다. 제나라에 많은 군대를 파병한 연나라에 기근이 들자 혜문왕은 이 때가 절호의 기회다 싶었다. 때마침...
-
수주대토(守株待兎)-행운은 결코 눈이 멀지 않았다
땀 흘리지 않은 결과물은 초라하다. 세월을 익히지 않은 열매는 조그많고, 정성을 쏟지 않은 작품은 허접하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이치다. 이치도 가끔은 어긋난다. 하지만 어쩌다 어긋나는 이치에 귀중한 삶을 맡길 순 없지 않겠나. 누구나 행운을 부러워한다.한데 행운이란 것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열에 아홉은 최선의 부산물이다. 춘추전국시대 송(宋)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다. 하루는 밭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가다 밭 가운데...
-
삼고초려(三顧草廬)-진심으로 진심을 움직여라
힘으로 부리는 건 하급이다. 힘이 두려워 모인 무리는 힘이 빠지면 바로 흩어진다. 명예로 부리는 건 중급이다. 명예에 흠집이 생기면 무리는 서로 눈치를 본다. 떠날까 말까. 마음으로 부리는 건 상급이다.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힘이나 명예를 곁눈질하지 않는다. 힘이 빠져도, 명예에 흠집이 생겨도 그 마음 그대로 따른다. 위·촉·오 삼국시대의 문턱 무렵, 유비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인재를 모으고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서서(徐庶)다. 비범...
-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소견이 좁으면 목소리가 크다
머리는 수시로 어긋난다. 판단은 빗나갈 때가 많고, 추론도 오류가 잦다. 책을 단 한 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다. 달랑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논하고, 그게 다 맞다고 우기면 대책이 없다. 소견이 좁으면 목소리가 큰 법이다. 한뼘짜리 앎에 맹신이 가득한 때문이다. 조약돌만한 소견으로 태산을 논하는 건 무지의 오만이다. 모르면 묻고, 모르면 살펴봐야 한다. 보지 않은 건 확신하지 마라. 본 것조차 속이는 게 세상이다. 한나라 9대 황제 선제...
-
백미(白眉)-특출나면 시기하지 않는다
거지가 시기하는 사람은 백만장자가 아니다. 그건 자기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거지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이다. 인간은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러러 보고 존경한다. 시기의 대상은 자기보다 처지가 조금 나은 사람, 자기와 엇비슷한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기껏해야 그와 같거나 그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또 하나. 누군가의 시기가 불편하다면 지금보다 더 뛰어나면...
-
합종연횡(合從連衡)-이익을 좇아 이합집산하는 인정
세상은 이익을 따라 모이고, 이익을 좇아 흩어진다. 좀 냉정한 듯하지만 이합집산(離合集散)의 중심에는 이(利)가 있다. 단지 이익을 내걸으면 모양새가 빠지니 이런저런 명분을 앞세울 뿐이다.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한다. 정치적 냄새가 짙은 슬로건이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누구는 뭉쳐서 살지만 누구는 뭉쳐서 죽는다. 누구는 흩어져서 죽지만 누구는 흩어져서 산다. 진(秦)·연(燕)·제(齊)·초(楚)·한(韓)·위(魏)...
-
형설지공(螢雪之功)-재능은 노력을 이기지 못한다
노력의 가치는 어디서나 빛난다. 빛나는 것은 모두 그 안에 수고로움을 품고 있다. 씨앗이 영글어야 열매가 튼실하다. 세월을 익혀야 쭉정이가 되지 않는다. 진짜 농부는 한여름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을 찾지 않고, 초가을 태풍이 거세다고 논밭을 떠나지 않는다. 곡식은 농부의 그런 정성으로 하루하루 익어간다. 쉽게 오는 건 쉽게 간다. 거저 얻은 건 십중팔구 스스르 사라진다. 동진(東晉·317~419)은 중국 역사상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핀 나라다...
-
송양지인(宋襄之仁)-어설픈 명분은 독이 된다
명분과 실질은 수시로 기싸움을 한다. 명분은 순리와 이치를 앞세우고 실질은 현실을 중시한다. 베풂은 명분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지는 실질이다. 베풂이 상대에게 되레 해가 된다면 명분은 맞지만 실질은 어긋난 것이다. 베풂이 스스로에게 독이 된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다. 인간은 수시로 명분과 실질을 저울질한다. 지혜란 다른 게 아니다. 그 둘의 균형을 잡는 게 바로 지혜다. 송나라 군사가 강을 두고 초나라 군사와 마주했다. 송나라 양공(宋襄)이...
-
발본색원(拔本塞源)-환부를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나무가 시들면 뿌리를 봐야 한다. 원인은 십중팔구 뿌리에 있다. 치명적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 살이 돋는다. 통증이 겁난다고 적당히 연고나 바르면 환부가 더 깊어진다. 미봉(彌縫)은 응급조치, 임시변통이다. 미봉은 근본을 바꾸지 못한다. 악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번성한다. 주나라 주공(周公)은 공자가 평생 흠모한 인물이다. 유가들이 고대 중국의 최고 성인으로 추앙하는 주공은 문왕의 넷째 아들이며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동...
-
모순(矛盾)-차고 넘치는 세상의 이중잣대들
인간의 눈은 시력만큼 밝지 않다. 아득한 지평선은 내다보면서도 정작 한 치 앞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 남의 눈 티끌은 바위만하게 부풀려보면서도 정작 자기 눈의 들보는 의식조차 못한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의 시선에 맞춰 세상을 해석한다. 만물의 어긋남은 거기서 생겨난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시장에서 방패를 흔들며 외쳤다.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