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추한 내방

필자가 주로 머무는 시간이 많은 곳은 교회 목양실이다. 집은 교회 밖에 있다. 집에서는 주로 식사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잠을 자는 일을 한다. 그 목양실은 교회 옥탑방이다. 이 교회로 올 때부터 옥탑방이 목양실이었다. 이 옥탑방 목양실은 4층에 위치한다. 목양실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지라 하루에도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하여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한다. 목양실은 약 7평 정도 된다. 목양실 한 면은 창문이 하나 있고, 바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하나 있다. 나머지 삼면은 책장에 책들이 꽂혀있다. 책장도 필자가 이 방을 사용하기 전부터 있던 것이니 중고나 마찬가지이다. 모자라는 책장은 여기저기에서 사용하다 들어온 책장이다. 소장하고 있는 책도 필자가 책을 구입하고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는 수십 년 된 책들이니 책 특유의 쾌쾌한 냄새도 난다. 전에 어느 성도가 가져다준 중고 의자, 중고 턴테이블과 오디오 시스템, 책상도 수십 년이나 될법한 볼품없는 것들이며, 문서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도 골동품 같은 삼보 제품이다. 겨울에는 난방 도구라고 해보아야 이동식 열풍기 하나와, 여름에는 선풍기 대신 가끔 사용하는 에어컨도 대우 벽걸이 골동품이다. 이것들을 올해 신형으로 교체했다.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키가 서로 다른 책장 속에서 색이 바래 누런색을 띠는 책들과 잘 단장된 책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나름 엔티크한 분위기가 연출되곤 한다. 또한 책장에 여백이 없어 여기저기에 책을 쌓아 놓기도 하고, 그동안 설교문을 출력한 A4 종이가 거의 사람 키만큼 쌓여 있기도 하다. 누가보아도 좀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누추하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보통은 4층 목양실이 아닌 1층 사무실에서 만나서 차를 대접하곤 한다.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면 목양실로 잘 모시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어떤 손님이 목양실을 좀 보자고 하면 “누추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목양실 안으로 모시기도 한다. 이렇듯 손님에게 보이기에는 다소 누추한 목양실이지만 필자에게는 참 편안하고 좋다.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작성하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를 다듬어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마음과 정신을 예수 정신으로 함양해가는 산실이기에 필자에게는 너무나 좋다.
조선 시대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글을 남긴 선비가 있었다. 그가 바로 허균(1569-1618)이다. 그의 산문 ‘누추한 내방’의 글을 보자. “방의 넓이는 10홀, 남으로 외짝 문 두 개 열렸다. 한낮의 해 쬐어, 밝고도 따사로워라. 집은 겨우 벽만 세웠지만, 온갖 책 갖추었다. 쇠코잠방이로 넉넉하니, 탁문군(卓文君)의 짝일세. 차 반 사발 따르고, 향 한 대 피운다. 한가롭게 숨어살며, 천지와 고금을 살핀다. 사람들은 누추한 방이라 말하면서, 누추하여 거처할 수 없다 하네. 내가 보기엔, 신선이 사는 곳, 마음 안온하고 몸 편안하니, 누추하다 뉘 말하는가. 내가 누추하게 여기는 건, 몸과 명예 모두 썩는 것. 집이야 쑥대로 엮은 것이지만, 도연명도 좁은 방에서 살았지. 군자가 산다면, 누추한 게 무슨 대수랴.”(『누추한 내방』에서 인용)
그렇다. 어떠한 공간이 잘 정돈되지 않아 남들이 보기엔 누추할지 몰라도, 그 방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면 그 방은 더이상 누추한 방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최신 건축에 현대식으로 잘 만들어진 방이라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누추한 방이다.
‘군자가 산다면, 누추한 게 무슨 대수랴’라는 글귀가 여운을 남긴다. 그 군자를 예수 정신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떨까?
고병국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3000만원 날리고 '경악'…"겁나서 휴대폰 못 만지겠어요"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7065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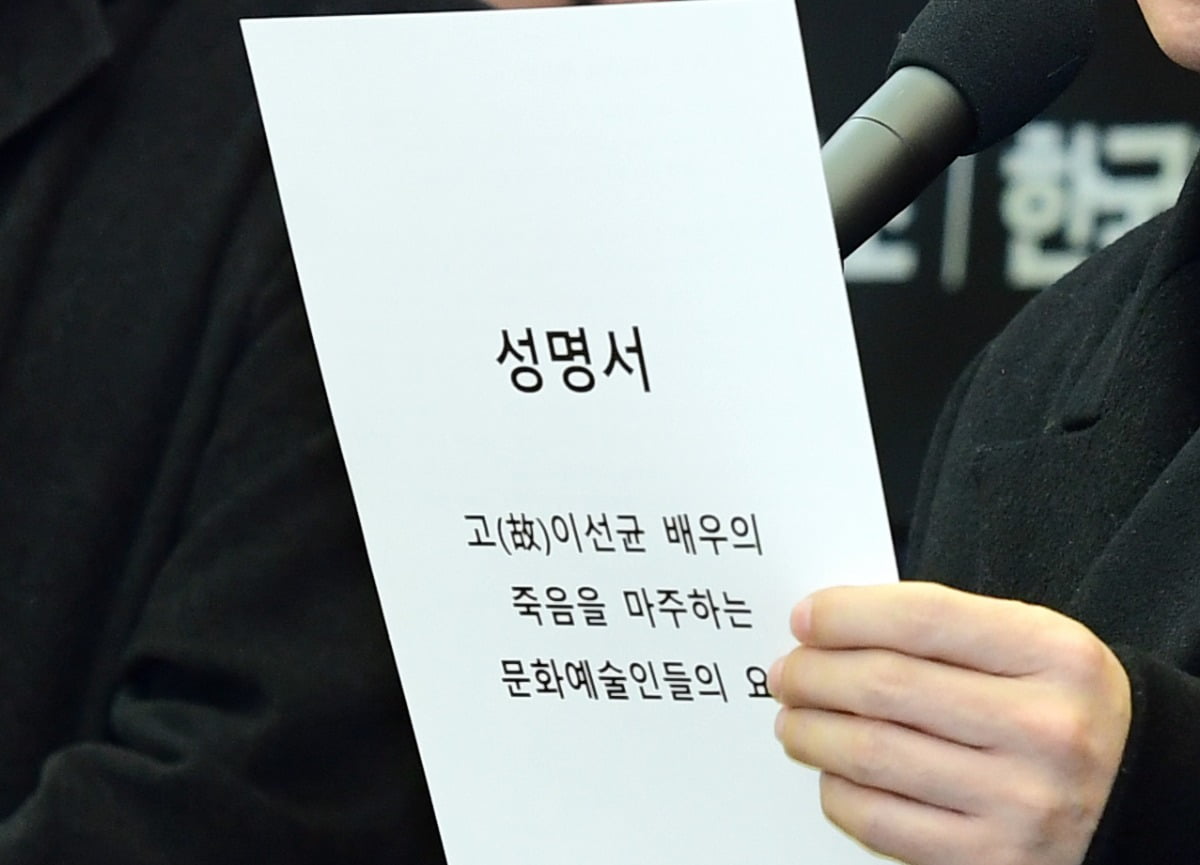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