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시]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좀 보아요
고두현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낮은 파도에도 멀미하는 노을
해안선이 돌아앉아 머리 풀고
흰 목덜미 말리는 동안
미풍에 말려 올라가는 다홍 치맛단 좀 보세요.
남해 물건리에서 미조항으로 가는
삼십 리 물미해안, 허리에 낭창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섬들은 수평선 끝을 잡아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당기는데
지난여름 푸른 상처
온 몸으로 막아주던 방풍림이 얼굴 붉히며
바알갛게 옷을 벗는 풍경
은점 지나 노구 지나 단감 빛으로 물드는 노을
남도에서 가장 빨리 가을이 닿는
삼십 리 해안 길, 그대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저토록 몸이 달아 뒤척이는 파도
그렇게 돌아앉아 있지만 말고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좀 보아요.
남해 물건리에서 미조항으로 이어지는 물미해안도로. 부드럽게 휘어진 해안이 아름다운 여인의 나신 같다. 그 곡선을 타고 미풍이 매끄럽게 흐른다. 물건리 바닷가의 초승달 같은 방풍림을 지나 은점, 노구, 가인포, 초전 해변을 따라가면 미조항에 닿는다. 바닷바람을 받으며 그렇게 삼십 리를 걷는 길이 물미해안도로다.
이 길에서 ‘결핍이 완숙을 채운다’는 말을 떠올린다. 이곳에 각별한 느낌을 갖는 이유는 따로 있다. 어머니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가족은 남해 금산 보리암 아래의 작은 절집에 얹혀살았다. 너무나 가난해서 절집 곁방도 감지덕지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버지는 옛적 북간도에서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 지난한 세월을 어머니는 허드렛일까지 겸하는 공양주 보살로 견디셨다.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어중간한 삶이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처의 고등학교로 떠나자, 어머니는 이제 됐다 싶었던지 머리를 깎고는 스님이 되셨다. 그리고 물건리에 있는 미륵암에 자리를 잡았다. 그 암자는 방풍림과 너른 들판 가운데에 있었다. 당연히 방학 때마다 나는 이곳으로 ‘귀가’했다. 나중에 물건리는 ‘독일마을’로 더 유명해졌다.
어릴 때는 왜 몰랐을까. 남해안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물미해안의 절경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발견하다니…
이곳을 아름다운 여인, 그리운 사람의 느낌으로 재발견한 것은 행운이었다. 외환위기 직후 어수선하던 1998년 초가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물미해안은 내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 해안길을 걸으며 얻은 시가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다. ‘가을’이라는 계절적 요소에 ‘노을’이라는 회화적 요소를 얹고, 그 화선지 위에 ‘그리움’이라는 색채를 입혔으니 자연이 내 몸에 붓을 대고 시를 써 준 형국이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상징은 ‘남도에서 가장 빨리 가을이 닿는/ 삼십 리 해안 길’과 ‘그대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저토록 몸이 달아 뒤척이는 파도’와 ‘그렇게 돌아앉아 있지만 말고/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것 좀 보아요’라고 말 건네는 사랑의 언어다.
얼핏 ‘달콤한 외로움’과 ‘관능적인 풍경’이 먼저 드러날 것 같기도 하지만, 행간에 젖어 흐르는 물기와 알 수 없는 결핍감이 함께 배어나오는 그런 그림이랄까. 특별히 기교를 부리거나 행갈이를 바꾸지는 않았다. 그냥 자연의 몸이 보여주는 걸 보고 옮긴 것이다. 다만 운율과 말맛은 중시했다.
이 작품을 발표한 몇 달 뒤에 파리로 1년 간 연수를 떠났는데, 그해 가을 정진규 선생이 신문에 쓴 평을 보고 ‘수평으로 누워서 일어서는 시’라는 맛의 의미를 새삼 발견했다.
“거기가 어딘지 나는 모르지만 이 가을 그리로 떠나고 싶다. 가을은, 아니 단풍은 산의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바다에서도 ‘멀미’를 할 지경이네. 해안을 돌아앉은 여성의 ‘흰 목덜미’로 보아낸 그 이미지도 새로운 탄생이다. 거기에 해안 삼십 리길의 가을바람. 가을 햇살. 그것들의 ‘낭창낭창’과 ‘잘 익은’이 내보이는 말씀의 ‘몸’. 그 감성의 유약(柔弱)을 얼른 알아차린 수평선의 팽팽함. 그 남성적 추스름. 수평으로 누워서 일어서는 시.” (중앙일보 ‘시가 있는 아침’-고두현의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정진규, 2002.10.21)
2005년 여름에 이 시를 표제작으로 삼은 시집이 나왔고 제10회 시와시학 젊은시인상을 받게 된 뒤로 물미해안을 자주 찾게 됐다. 물미해안을 중심으로 남해금산과 노도(서포 김만중 유배지) 등을 둘러보는 문학기행 코스가 생긴 덕분이다.
1년에 한두 번씩 주말에 1박2일 일정으로 문학기행팀과 물미해안을 찾는다. 그럴 때마다 내 몸을 빌려 시 한 편을 낳게 해 준 물미해안의 낭창낭창한 허리를 은근하게 안아보곤 한다.
오늘처럼 섬들이 ‘수평선 끝을 잡아/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당기는’ 날엔 그곳에 가고 싶다. ‘허리에 낭창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는 삼십 리 물미해안, 그 바다에 단풍 드는 모습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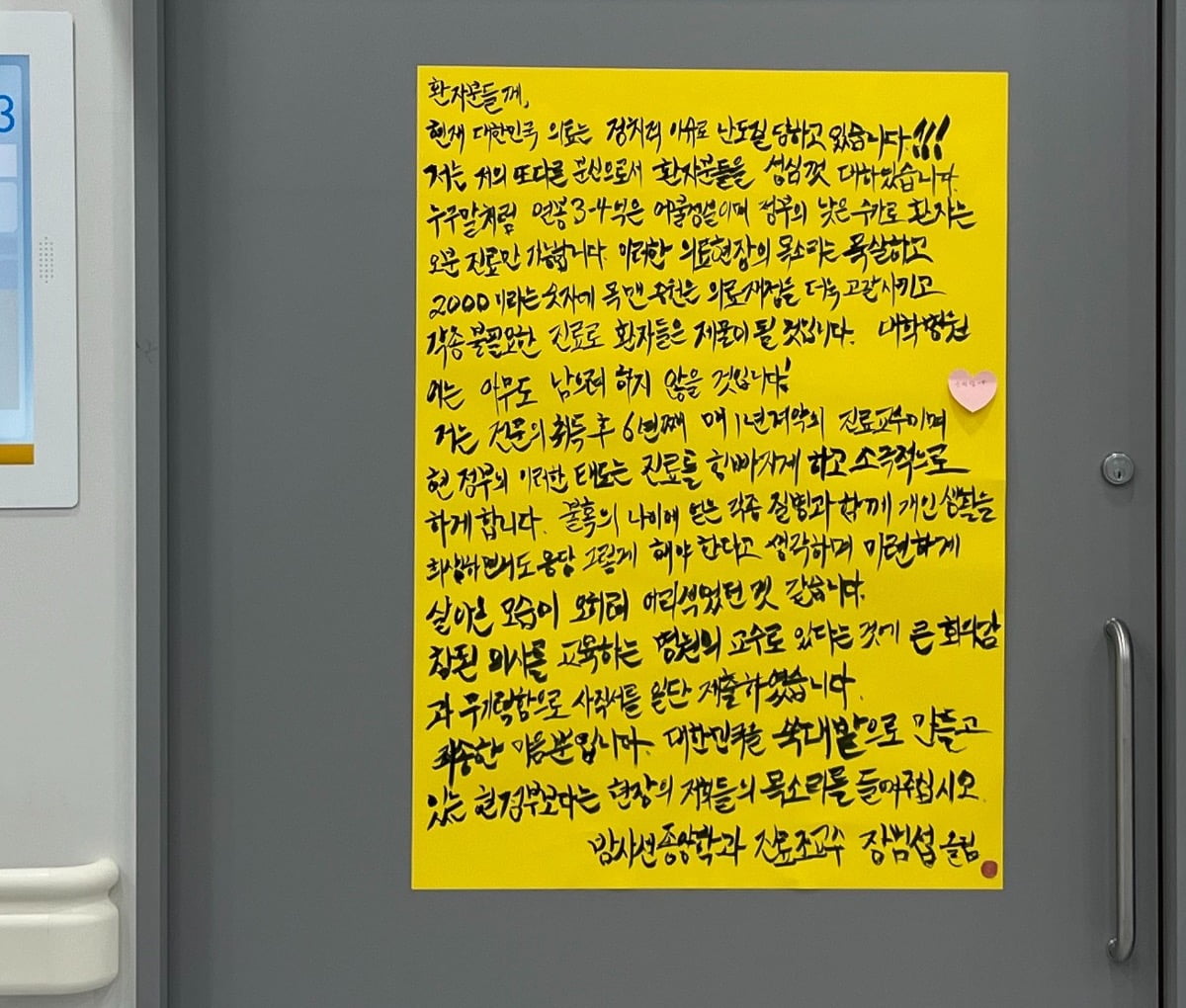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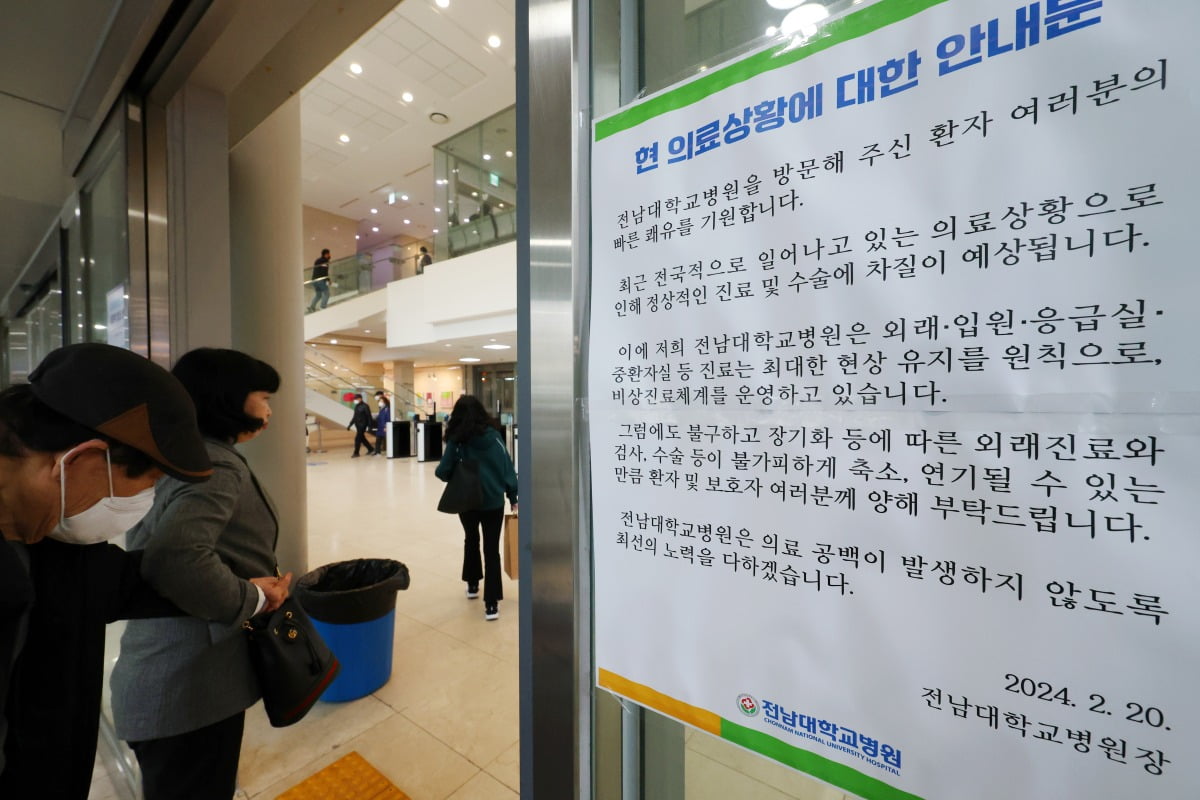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