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春의 주역적 의미
이전에는 음력을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구정을 올바른 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양력을 洋曆 즉 서양에서 들어온 달력으로 생각하는 이도 있다. 양력 음력할 때의 한자는 陽曆 陰曆으로 太陽의 운동주기를 기준으로 한 달력과 太陰(즉 달)의 운동주기를 기준으로 한 달력이란 뜻이다. 우리의 전통은 양력을 쓰지 않고 음력만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이다. 동양의 역법은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태양력(즉 양력)과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태음력(즉 음력)을 모두 사용했다. 달의 모양을 직접 보여주는 초하루 보름 그믐등의 일상적 날짜는 음력으로 정하지만, 농사의 중요한 기준점인 24절기는 오차가 적은 양력을 써왔다.
그러면 도대체 설날은 신정이 맞을까 구정이 맞을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왕조마다 새해첫날을 달리 잡았으며, 크게 나누면 역사적으로 冬至설, 섣달설, 정월설의 3가지로 존재해왔다. 그래서 고대시기에서부터 새해 첫날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열띤 논쟁이 있었다.
주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歲首는 정확히 동지라고 생각한다. 주역으로 동지는 復卦

그것은 당연히 해의 길이가 그 시점으로부터 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만일 동지가 아니라면 1년 365일중에 어느 날이 가장 기준이 되는 날일까? 그날이 그날같기만 한 1년중에 어느 한 날을 꼭집어 말하기가 쉽지 않다. 얼핏 떠오르는 것이 하지 정도? 아니면 춘분이나 추분? 이런 날들도 의미심장한 시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동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해가 길어진다는 점에 있다. 해가 길어지면 비록 지금 당장은 춥지만 가까운 장래에 다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 희망은 생명의 復活을 믿게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금이야 날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봄옷을 바꿔입는다는 의미밖에 없을지는 모르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연의 변화에 의존해야했던 고대시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직은 한겨울이지만 해가 길어진다는 사실 자체는 추운 겨울을 나는 원시인들에겐 푸른 봄의 서광이자 생명의 약속과도 같다. 이 날까지로 모든 생명활동은 極低點에 이르렀지만, 이제 모든 생명있는 것들은 죽음의 고통에서 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생명의 부활을 꿈꾸는 날이 된다. 그렇게 동지는 새로운 태양이 시작되는 새 생명의 도래를 의미함으로써, 철학적 종교적 비중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동지는 우주질서의 중심축(axis mundi)으로서 성스러운 시간이다. 이것은 엘리아데가 말한 아득한 태초(in illo tempore) 즉 비롯함의 시간으로 복귀하는 비일상적인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비일상적인 성스런 시간을 통하여 인간은 천과 교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은 오랜 옛날부터 태양의 축제날이 되었다. 석굴암에서든 스톤헨지에서든 피라미드에서든 1년중 밤길이가 가장 긴 동지 저녁이나 동지 다음날 첫 태양이 뜬 아침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동지에 南郊에서 圓丘에서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가장 성대한 국가제사를 거행했다. 이 동지의 제천의례는 천지가 개벽해서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천지의 ‘재생(rebirth)’을 경축하는 의례이다. 우리의 전통습속으로는 예부터 동지때 팥죽을 쑤어 먹었다. 팥죽속에 든 새알심이라는 것은 동지의 그 기나긴 밤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않았던 태양의 기운, 즉 양기운의 근원을 상징하며, 復卦

그런데 우리 지금은 동지를 세는 풍습은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이 날을 대신한 것은 크리스마스이다. 크리스마스는 본래 예수의 탄생일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 동지날의 상징적 의미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다. 아기예수의 탄생이란 기나긴 암흑속에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의미하며, 기나긴 밤중속의 한줄기 희망의 빛이며, 팥죽속에 들어있는 새알심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그날은 아마 1년중에서 가장 흥청이는 날일 것이다. 우리의 전통 명절을 맞은 것 이상으로 들뜬다. 이렇게까지 크리스마스가 한 특정종교의 명절을 넘어서 전세계의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一陽의 始生을 축하하던 동지의 오래된 습속에서 배양되어온 잠재의식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크리스마스와 구정의 사이에 끼어있는 신정 역시 동지 祭日과 관련되지만, 이미 동지로부터 10일 정도 경과되고, 또 불행하게도 일제시대에 강제로 세수를 정했다는 기억으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도 신정은 동지와 그 의미가 연관되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우리 설날은 구정이다. 군사정권때 민심을 얻기위한 술책으로 신정에서 구정으로 공휴일을 변경했다고는 하지만, 역사를 되돌린 변화를 가능케한 것은 수천년을 지속해온 오랜 전통의 힘이다. 동지나 크리스마스나 신정은 모두 양력 계산법으로 따지는 것이라서 일정하지만, 구정은 음력으로 계산하다보니, 정확히 어느 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개 소한 대한 지나고 2월 초순 입춘 무렵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입춘의 의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주역으로는 동지의 復卦에서 양이 하나 더 자라난 臨卦

그리고 3월은 개학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9월을 신학기로 삼는 나라도 있지만, 아무튼 겨울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나간다. 절기상으로는 경칩과 춘분이 들고 역학적으로는 地天泰卦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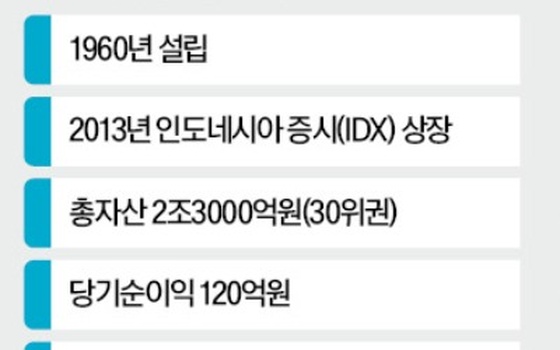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