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시] 프랑시스 잠은 왜 당나귀를 좋아했을까
프랑시스 잠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 병에 우유를 담는 일,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옴 오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 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베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을 거두어들이는 일.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에서 평생 사랑과 생명을 노래한 전원시인 프랑시스 잠(1868~1938). 그는 절친한 벗 앙드레 지드와 알제리를 여행한 것과 잠깐 동안의 파리 생활을 제외하고는 외딴 산골 마을에서 지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껴안고 어루만지는 포용과 모성의 시인, 세기말 프랑스 문학의 퇴폐적인 요소를 씻어낸 자연주의 대가로도 꼽힌다. 시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에 나오는 정서 그대로였다.
그의 작품도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겸손과 온화로 이끌어주는 것들이었다. 고답적이고 난해한 시에 넌더리를 내던 독자에게는 청순한 샘물과 같았다. 이른바 ‘잠주의(Jammisme)’라는 문학운동까지 생겼다. 당시 주류를 이루던 난해하고 기교적인 시와 달리 간명하고도 쉬운 시로 독자를 사로잡은 결과다.
그는 ‘전깃줄 위에 앉은 제비들의 슬프고 불안한 모습’처럼 위태로운 시대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시인이기도 했다. 1919년 ‘기독교 농경시’를 발표한 뒤로는 대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부의 삶을 통해 종교적 가치와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되새겼다. 르네 랄루가 그를 ‘우아의 시인이며 은총의 시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를 좋아한 시인들이 많았다. 릴케, 말라르메 등 서양 시인뿐 아니라 동양의 윤동주와 백석도 그를 사랑했다. 릴케 소설 《말테의 수기》에서 청년 말테가 반한 시인은 당대 최고의 파리 시인들이 아니라 ‘맑은 공기 속에 울려퍼지는 종소리 같은 시인’ ‘자기 집 창문이나 아련히 먼 곳을 비추는 책장의 유리문 이야기를 해 주는 행복한 시인’ 프랑시스 잠이었다.
식민치하 조선의 백석과 윤동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프랑시스 잠과 릴케의 이름을 시에 녹여냈다. 백석은 시 ‘흰 바람벽이 있어’에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라고 썼다.
동주도 ‘별 헤는 밤’에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라고 썼다.
동주는 그의 시를 필사한 노트 옆에 ‘구수해서 좋다’고 써놓기도 했다. 윤동주의 북간도 친구인 문익환 목사는 “동주가 연희전문 시절 잠의 시집을 간직하고 읽었는데 제목이 《밤의 노래》였다”고 회고했다. 나중에 《새벽의 삼종에서 저녁의 삼종까지》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된 시집이다.
프랑시스 잠은 그 시집 서문에 ‘나는 지금 장난꾸러기들의 조롱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는, 무거운 짐을 진 당나귀처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는 가겠나이다./ 삼종의 종소리가 웁니다’라고 썼다. 그는 당나귀를 너무나 좋아해서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며 당나귀 시편을 많이 남겼다. 그의 별명도 ‘당나귀 시인’이었다.
백석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미명계’ ‘연자간’ ‘귀농’에 당나귀가 나오고, 동주 시 ‘밤’ ‘곡간’에도 당나귀가 등장한다. 프랑시스 잠과 백석, 동주를 잇는 당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백석이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고 할 때 당나귀는 연인과 함께 산골마을로 가는 꿈의 매개다. 동주가 ‘밤’에서 한밤중 당나귀에 여물짚을 주는 아버지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 모습을 겹친 것도 사랑과 생명과 희망의 메타포다.
이들이 살던 시대는 냉엄했다. 프랑시스 잠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 쟁탈기에 태어났다. 백석은 105년 전 청나라가 망한 해에 나서 평생을 변방인으로 살았다. 동주는 100년 전 러시아 혁명기에 나 2차대전이 끝나기 6개월 전 옥사했다. 제국주의와 국수주의가 충돌하던 역사의 격변기에 인간과 삶의 근본을 되새기던 시인들….
한편으로는 생의 무게를 말없이 견디는 존재가 당나귀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박함의 상징인 당나귀, 그러면서도 삶과 시대의 불협화음을 보듬어 안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곧 시인과 닮았다.
프랑시스 잠은 그렇게 70년을 피레네 산록에서 산 뒤 1938년 11월1일 ‘잠처럼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시에 나오는 구절처럼 ‘따뜻한 달걀을 거두어들이듯’ 맑고 온화한 날이었다.
당나귀가 나오는 프랑시스 잠의 시 한 편을 보너스로 싣는다.
당나귀와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한 기도
오 주여, 내가 당신께로 가야 할 때에는
축제에 싸인 것 같은 들판에 먼지가 이는 날로
해 주소서, 내가 이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낮에도 별들이 빛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나 자신
선택하고 싶나이다.
내 지팡이를 짚고 큰 길 위로
나는 가겠나이다. 그리고 내 동무들인 당나귀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나이다 – 나는 프랑시스 잠,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 하느님의 나라에는 지옥이 없으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하겠나이다 – 푸른 하늘의 다사로운 동무들이여,
날 따라들 오게나, 갑작스레 귀를 움직여
파리와 등에와 벌들을 쫓는
내 아끼는 가여운 짐승들이여-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짐승들 사이에서,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나타나도록 해주소서.
이들은 머리를 부드럽게 숙이고
더 없이 부드러워 가엾기까지한 태도로
그 조그만 발들을 맞붙이며 멈춰 섭니다.
그들의 수천의 귀들이 나를 뒤따르는 가운데
허리에 바구니를 걸친 당나귀들이
나를 뒤따르는 가운데
등에 울퉁불퉁한 양철통을 실었거나
물 든 가죽부대 모양 똥똥한 암당나귀를 업고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당나귀들이
나를 뒤따르는 가운데
파리들이 귀찮게 둥글게 떼지어 달려드는
피가 스미는 푸르죽죽한 상처들 때문에 조그만 바지를 입힌 당나귀들이
나를 뒤따르는 가운데
주여, 나는 당신 앞에 이르겠나이다.
주여, 내가 이 당나귀들과 더불어 당신께 가도록 해주소서.
소녀들의 웃음짓는 피부처럼 매끄러운
살구들이 떨고 있는, 나무들 울창한 시내로
천사들이 우리를 평화 속에서 인도하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영혼들이 사는 그 천국에서
내가 당신의 그 천국 시냇물에 몸을 기울일 때
거기에 겸손하고도 유순한 그들의 가난을 비추는 당나귀들과
영원한 사랑의 투명함에
내가 닮도록 해주소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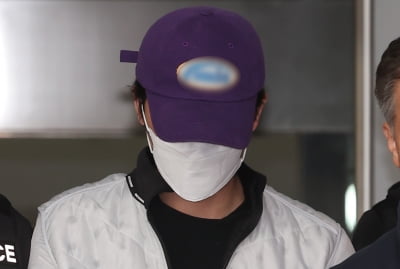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홀로 늙어가는 사람들 이야기… 노후 거주지는 이것 따져라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5729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