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가게에서 생긴 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프랑스에서 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적도 있고, 괜히 악수를 청하며 다가오는 청년들을 애써 외면하며 걸었던 경우도 많았다. 물론, 그들이 청하는 악수를 받으면 순식간에 몸에 있는 지갑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말이다. 비단 프랑스에서만 그런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많은 나라는 그들을 이용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였지만, 그런 프랑스에서의 해프닝들이 아름다운 프랑스의 이미지를 반감시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에는 틀림이 없다.
난 여행을 할 때, 대부분을 걸어서 한다. 아주 긴 거리라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만 가까운 거리는 대부분 걸어서 다닌다. 샹젤리제에서 노틀담 성당, 그리고 다시 노틀담 성당에서 몽마르뜨 언덕에 이르기까지 멀다면 멀다고 할 수 있는 거리를 모두 걸어서 이동했다. 길을 걸으며 보는 현지인들의 옷차림과 크고 작은 가게의 쇼 윈도우를 보는 것도 여행의 큰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왠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이런 즐거움들을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나를 더 걷게 만들었는 지도 모른다.
하루 종일 버스 한 번 타지 않고 걸어 다녔던 적도 참 많았다. 많이 걸으면 에너지 소모가 빨라서 수분 공급을 위해 물도 계속 마셔야 했고 허기도 빨리 찾아 와서 무엇인가를 먹어야 했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아닌 여행하는 나라의 작지만 분위기가 좋은 식당이나 빵집을 발견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없고 오늘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 설레임 이상의 것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그 날도 난 오래 걸어서인지 호텔에서 아침을 많이 먹고 나왔음에도 배가 고파졌다. 뭔가 먹고 싶었다. 운이 좋게도 한 열 다섯 평 정도되는 규모의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발견했다. 아직 점심시간이 되기에는 한참 전이라 가게 안은 한산했다. 내가 주문할 차례가 왔다.
“ 여기서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는 무엇인가요? ”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이는 프랑스 아주머니는 나의 우문에 친절한 현답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약간 싸늘한 표정의 아주머니는 나의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난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 음… 저기… 이 집에서 어떤 샌드위치가 가장 잘 나가나요.?
여전히 묵묵부답인 아주머니. 이번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표정이었다.
난 당황스러웠고 한 편으로는 조금 화가 났다. 손님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하지 않는 점원이라니. 내가 정말 문화로 가득 찬 프랑스에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난 더 이상의 질문을 포기하고 샌드위치 진열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 이걸로 할께요.”
나의 목소리에도 이미 약간의 노여움이 섞여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난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 돈을 받았다. 물론 돈을 주고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점원. 몇 분을 기다리니 내가 주문한 샌드위치가 나왔다. 그런데 난 나의 눈을 의심했다. 샌드위치 빵이 먹기에는 불편할 정도로 타있는 것이 아닐까. 난 화가 치밀어 올라 말했다.
“ 빵이 너무 타 있군요. 새로 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역시 말이 없는 점원 아주머니. 대답이 없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안 나는 환불을 요구했고, 싫으면 그냥 가라는 식으로 돈을 내주었다. 난 돈을 받아 그 가게를 나와 걸었다. 기분이 너무 나빴다.
문득 프랑스에서 영어를 쓰면 알아 들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직장 선배의 말이 생각났고 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 점원이 나의 영어를 알아 들었는지 못 알아 들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그 점원 아주머니는 나의 영어에 기분이 나빠졌던 걸까.
영어 배우기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떠들썩한 한국. 식지않는 영어 배우기 열풍으로 가득한 한국.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대학입시에서도 영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치하는 한국과 영어를 알아 들어도 자국어를 쓸 것을 은연 중에 강조하는 프랑스. 과연 어떤 것이 글로벌 시대에 더 맞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겨 혼란스러워졌다. 사실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다. 분명한 것은 두가지 경우가 다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차이는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기 위해 배우는 영어와 알아도 모국어를 너무 사랑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영어라는 것이다.
지금 와서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니 그 점원의 태도 또한 프랑스식 생활방식의 일부였고 그런 것 조차 오해 없이 잘 이해하는 것이 상대주의적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기 보다는 그 상황에 적절히,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 점원이 나의 영어를 못 알아 들어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프랑스에는 친절한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이다. 난 여전히 프랑스를 좋아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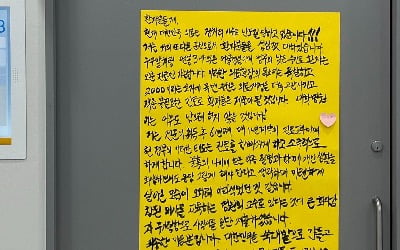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