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맺었어도 임피 적용"

대법원은 지난 5월 12일 근로자 A 등 21명이 B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 공기업인 B공단은 201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접수하고 같은해 8월 전직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노조위원장과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도 조합원 투표를 거쳐 도입에 찬성했고 결국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연봉을 지급 받게 된 A 등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등 다양한 주장을 펼쳤지만, 무엇보다도 2019년 대법원 판결(일명 '문경레저타운'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사건을 살펴보자. 정년이 2년 남았던 원고 근로자는 골프장과 스키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연봉을 7000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후 회사가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년이 2년 남은 근로자에게는 연봉 60%, 1년 미만 남은 근로자에게는 40%만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연봉계약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노조가 동의해 준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만 하더라도 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해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가 당연히 우선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2018다200709). 이를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A 등은 자신이 회사와 매년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와 상관 없이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A 등이 매년 개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근로자들의 주장을 부정했다.
임금피크제에 따라 이 회사가 도입한 개정 보수규정에 따르면 회사와 A 등은 개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되 연봉금액은 '정액 연봉'과 사후적으로 정해지는 '성과급과 부가급여'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다만 별도 조항에서는 "연봉 금액이 별도 지침으로 변경될 경우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개별 연봉계약서의 연봉금액이…별도 지침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는 연봉계약서의 의미는 성과급과 부가급여를 무조건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가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이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연봉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개별 연봉계약이 별도로 있더라도 임금 부분이 별도 지침에 연동돼 있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에 우선하는 '개별 연봉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문경 레저타운 사건 이후 많은 기업에서 우후죽순 제기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연봉 계약까지 별도로 개별 계약하지 않는 이상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연봉계약서에 연봉이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그에 따라 연봉이 변경되는 것이고 결국 유리우선의 원칙이 애초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결(2019나2038909)도 그런 취지로 볼 수도 있었지만, 하급심이었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별도의 연봉계약'이 존재함에도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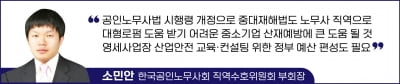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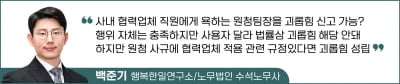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