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명저] "예술이 정치에 종속되면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
“인상주의는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철학적 사유로 이어졌고,
이는 정적인 중세적 세계관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
“외부로부터의 규제가 가해지면 그 예술은 기대했던
선전도구로서의 가치마저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천재와 걸작 중심으로 쓰이던 예술사에서 ‘작품을 소비하는 수요자’를 발견하고, 주체로 등장시킨 것도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의 기여다. ‘신비의 영역’에 있던 예술을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이끌어냈고, 이는 인접 학문에 영향을 미쳤다.
“인상파·고딕은 사회 진보의 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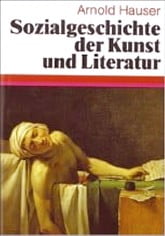
하우저는 작품이나 사조를 대할 때 반드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고대 동굴벽화, 영웅들의 서사시, 귀족 여성들의 연애소설, 계몽시대의 시민극, 현대 대중영화는 모두 당시 사회와 시대적 요구를 최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예술도 천재도 시대의 산물이라는 설명이다.
인상주의 사조를 ‘가장 도시적인 예술’로 해석하는 대목에서 그의 예술관이 잘 드러난다. 하우저는 인상파 작품을 볼 때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대상을 포착하는 기능적 측면 외에도 ‘도시 발전의 산물’로 보는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당시 급속히 형성되던 도시에 몰린 예술가들의 한층 긴장된 시선이 인상파 등장의 토양이 됐다는 주장이다. “인상주의는 ‘빛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듯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철학적 사유로 이어졌고, 이는 정적인 중세적 세계관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는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로 이어지는 근대 예술사조 중에서 고딕을 격찬했다. ‘시민계급의 대두’라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서다. 하우저는 노트르담 성당으로 대표되는 고딕의 대성당들은 소수 귀족의 예술이던 로마네스크에 대립하는 도시의 예술이자 시민의 예술이었다고 강조했다. “고딕은 그리스·로마 전통을 완전히 새롭게 하면서도 고전에 견줄 수 있는 것으로 대체했다. 근대 예술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혁이자 또 한 번의 점프였다.”
하우저는 20세기 이후의 예술이 “극도의 부정과 파괴로 뒤덮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1차 세계대전(1914~1918년)과 대공황(1929년)을 겪으며 행동주의와 극단주의 강화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전쟁과 공황으로 자유주의 실패가 우려되자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현실과 자연에 대한 극단적 부정이 나타났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르네상스 이래로 400여 년 동안 발전해 인상주의에 도달한 예술은 20세기 들어 기존 가치를 전부 의심하고 단절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반동이 몰아치자 현대 예술은 ‘자연에 충실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과제와 목표까지 부정했다. “자연에 대한 고의적 왜곡이 일상화돼 인상주의 이후의 예술은 ‘자연의 재현’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테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표현 방법에서도 전면적 파괴가 시도됐다. “회화는 ‘회화적 가치’를 부인하고, 시는 정서의 조화와 아름답고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배격하며, 음악은 멜로디와 음조를 파괴했다.”
이에 따라 입체파 구성주의 미래파 표현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 현대 예술은 부드러운 화음이나 아름다운 색조를 거부했다. ‘보기 싫은 예술’을 지향했다. 하우저는 “인습적 표현방식에 대한 체계적 투쟁과 19세기 예술전통의 해체는 1916년 다다이즘과 함께 시작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파괴적 경향이 이후 철학 미학 문학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反)문명적·무조건적 ‘반동 흐름’의 깊은 문화사적 연원을 일깨워주는 설명이다.
“현대 문화코드는 파괴·반(反)문명”
헝가리 태생인 저자는 그 시절의 많은 지식인처럼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탓에 이 책은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편협한 사고를 곳곳에서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하우저는 예술이 이념의 하위 수단으로 변질된 당시 소련의 상황을 비판했다. 사회혁명을 앞세우는 잘못된 접근이 수준 높던 소련 예술의 발목을 잡았다고 봤다. “외부로부터의 규제가 가해지면 그 예술은 기대했던 선전도구로서의 가치마저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특정 집단의 독점을 막고 예술을 대중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루브르미술관이 생기고나서부터 젊은 예술가들이 매일 걸작을 연구하거나 모사할 수 있게 됐다”며 파리를 만든 루브르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ecore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시사일본어학원] 착 붙는 일본어 회화 : 아무런 양해도 없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99864.3.jpg)




![기업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테슬라는 최대폭 매출 감소[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A.3645721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