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속옷까지…" 알고 보니 '극한직업' 박원순 비서

고소인 측은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성희롱, 성차별적 업무가 강요됐다"며 "이는 사실상 성차별이며 성폭력 발생과 성역할 수행에 대한 조장, 방조, 묵인,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평소 한 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며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했고, 결재 받을 때 시장님의 기분 상황을 확인. 비서에게 '시장님 기분 어때요? 기분 좋게 보고 하게...' 라며 심기보좌, 혹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비서실장들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알아야 할 사안이고 무엇을 몰랐던 것인가. 시장실과 비서실은 일상적인 성차별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고 비판했다.
고소인 측은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시장실에서 그대로 들어가 샤워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져다줘야 했고, 샤워를 마친 시장이 그대로 벗어두면 운동복과 속옷을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시장실 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잤다. 그런데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은 여성 비서가 해야 했다. 일정을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깨워 다음 일정으로 가면 효율적이나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다며 해당 일이 요구됐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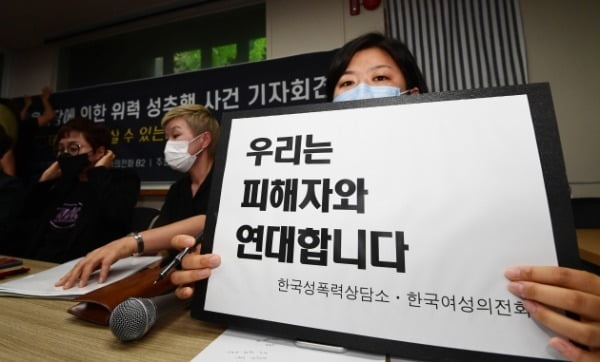
고소인 측은 "이 사건 피해자는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했다. 번번이 좌절된 끝에 2019년 7월 근무지 이동 후, 2020년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피해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도 이야기했으나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소인 측은 "서울시에서 일상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피해 제보는 비단 이번 사안만이 아니다"라며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술 취한 척 '뽀뽀'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 하며 다리 만지기 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등장하는 사례가 서울시의 여성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정규직 직원은 앞으로 공무원 생활에서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비정규직 직원은 재계약, 재고용 등 일신상의 신분 유지 불안을 이유로 신고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성폭력 사안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 2020년 4월에 있던 행정직 비서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추가 폭로가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은 "너무 더러워서 기사를 끝까지 못 읽겠다" "알고 보니 시장 비서가 극한직업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극성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은 "박원순에게 성추행 당한 것을 영광으로 알라" "이 정도가 성희롱, 성추행이냐" 등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