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돈 없어서 애 안낳는 것 아닌데"… 정부 12년간 '헛발질 대책'
126조 '출산 복지' 실패… 신생아 40만명선 붕괴
2006년부터 막대한 재정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 1.05명 역대 최저 기록
30대 초반 출산율 가장 크게 감소
보육 등 복지 확대 대책 전면수정해야

정부도 이를 모르는 건 아니다. 이미 12년 전인 2006년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126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이유다. 그러나 결과는 최악이다. 문제 접근부터 잘못돼 해결책이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속 돈만 쏟아붓는 정부

저출산위는 자녀 양육에 드는 돈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라 보고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2006~2010년)을 마련해 5년간 19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아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1.12명이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10년 1.2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을 마련해 돈을 더 쓰기로 했다.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 등을 위해 61조1000억원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2012년 출산율은 1.30명까지 늘기도 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이후 출산율은 다시 내리막길을 탔고 지난해에는 1.05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이면 ‘저출산’,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초저출산이 굳어지고 있다. 가임 여성인구가 줄고 혼인 건수마저 급감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슷한 대책을 나열한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세우고, 2016~2017년 2년 만에 45조5000억원을 썼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쓴 돈을 모두 더하면 126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 없던 ‘아동수당’까지 도입해 올해 9월부터 0~5세 아동 1인당(소득 상위 10% 가구 제외)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해 복지를 늘리는 것이 가장 쉽고 생색내기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출생아 수가 증가하지만 8분위부터는 오히려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 소득분위별로 가임여성 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출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보육 등 복지 확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복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라며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이후 복지는 거의 성역과도 같이 굳어지면서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돈을 주는 대신 부모에게 일시적으로라도 ‘거액’을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지는 한 번 늘리면 좀처럼 줄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 이민 확대 등을 통해 ‘인구절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경제구조나 기술수준, 노동력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민에 대해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단독]"세금으로 밀린 직원 월급 주네"...선넘은 '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올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789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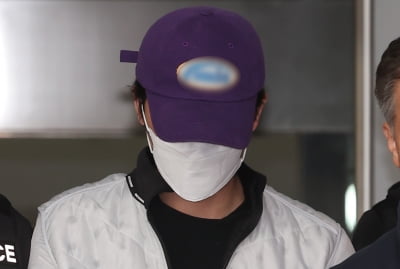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노인들은 아무리 말려도 왜 운전대를 놓지 않을까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6756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