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재정부족 메워달라"… 정부에 '청구서' 내미는 대학들
대학교육협의회·총장협의회 등 잇따라 예산 지원 요청
자율형 교육 시스템 약화… 대학정책 '국가 주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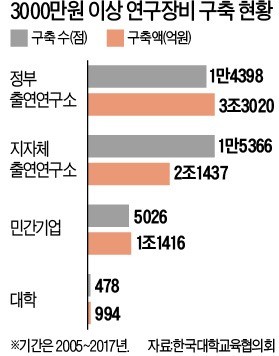
사립대 비중이 80% 이상인 상황에서 국가주도형 대학 모델로 단숨에 전환하는 건 비용 낭비라는 설명이다. 국내 대학들이 요구하는 연간 3조원이 지원되면 줄어든 등록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건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자립형 사립대”라고 말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도 “한국의 비영리형 사립대 모델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부러워하는 성공 사례”라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했다.
대학 진학률을 무작정 높이는 것이 능사인지에 대해선 해외에서도 반론의 목소리가 높다. 브라이언 캐플런 미국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교육 반대 사례: 왜 교육 시스템은 시간과 돈 낭비인가》라는 책을 내놓으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캐플런 교수는 1970년대 말 50%에 그치던 미국 내 학사학위자의 소득프리미엄은 2010년 이후 70%대로 높아졌지만 대졸자가 비대졸자에 비해 그만큼 역량이 높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대학진학률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데 집착하기보단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동휘/황정환 기자 donghui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어디서나 환영받는 스타벅스?…용인 고기동에선 '악몽'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415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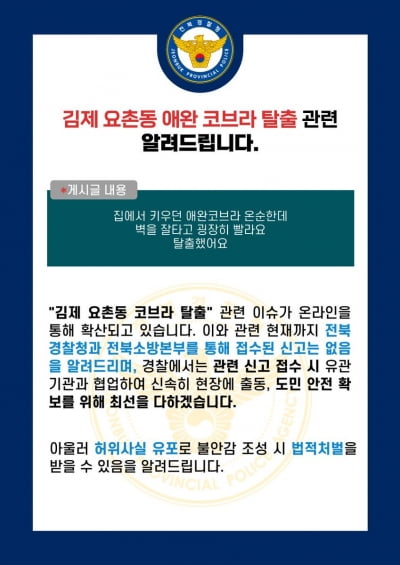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