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내쫓은 기아자동차 노조…본질은 노동개혁이다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기아차 노조의 결정은 외형적으로 보면 정규직이 비정규직들과 공생을 끝내고 쫓아낸 모양새다. ‘귀족노조의 기득권’ 행사라는 해묵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급조직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나 정의당의 유감성명도 그런 맥락이다. 노동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거나,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정규직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다는 측면만 보면 나올 법한 비판이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의 결별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닿는다. 무엇보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계약직·파견직 등으로 복잡한 노동시장의 후진성 문제다. 카스트 같은 고용노동시장의 ‘신분’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면서 산업현장의 이해관계도 그만큼 복층구조가 됐다. 이번 사태의 촉발제가 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대표적이다. 기아차에서 4000여명인 비정규직 중 1049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것도 힘겹게 도달한 노사합의였다. 그런데도 비정규직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독자파업까지 벌였다. 정규직 전환에 우호적인 법원의 판결들까지 얽혀 사측은 사측대로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돼 왔다.
늘 개혁은 시늉에 그친 채 강성 노조들이 주도해온 우리 노동시장의 모순점은 한둘이 아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62, 중소기업 정규직 52, 중기 비정규직 35인 임금구조(2015년, 노동연구원)는 그 결과일 뿐이다.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에서 노동소득의 양극화가 진짜 문제라는 지적도 같은 차원이다. 근본 과제인 고용의 유연성 확보가 늘 뒤로 밀리면서 노동시장의 모순은 심화됐지만 국회부터 전체 근로자의 10% 남짓한 노조세력에 포위당해 과도한 노동권만 남아있다. 박근혜 정부 때 4대 과제라던 노동개혁이 당근책만 내놓은 채 국회에서 길을 잃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도 대선후보 중 누구도 노동개혁은 언급도 않고 있다. 그게 더 걱정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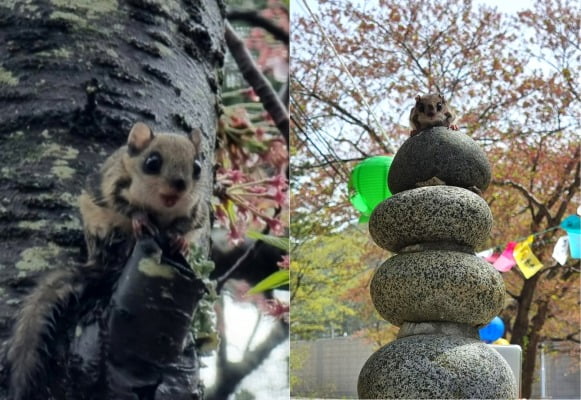
![[포토] 두부, 비전 선포식 개최…"지역 중심 영유아 발달 지원 전략 제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5581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