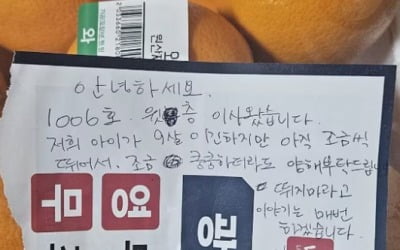[김과장&이대리] '퇴사 성공' 송별 파티 언제 끝날지 …그래도 꿈은 있다
![[김과장&이대리] '퇴사 성공' 송별 파티 언제 끝날지 …그래도 꿈은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634627.1.jpg)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과장 이대리’는 “고맙긴 한데…”라면서도 미심쩍어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약자 취급하는 게 언짢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들의 현실을 들어봤다.
이력서에 대충 찍은 셀카 붙이기도
중소 유리성형업체의 이모 과장(40)은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탓에 골치가 아프다. 인사팀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그는 지원 이력서를 받아볼 때마다 ‘억하심정’이 든다. 화장실 같은 곳에서 대충 찍은 셀카를 붙여 넣는 지원자는 ‘양반’이다. 자기소개서의 열정을 묻는 항목에 “나는 대충 일하고 싶다”고 쓴 사람도 있었다.
![[김과장&이대리] '퇴사 성공' 송별 파티 언제 끝날지 …그래도 꿈은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01.13638393.1.jpg)
입사 이후에도 골머리를 썩인다. 한 달 만에 퇴사한 뒤 ‘경력증명서를 떼달라’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과장은 “중소기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중소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에 2년여를 다녔던 양모씨(32)는 지난해 회사를 그만뒀다. 일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적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문제는 결혼이었다.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스스로 자신이 없었다. ‘듣보잡 기업’이란 이유로 반대할까봐 두려웠다. “결혼하려면 이름은 알 만한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친구들 조언도 들었다. 퇴사 후 시험을 거쳐 작년 말 유통 관련 중견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그는 올해 여자친구와 결혼한다. 양씨는 “비록 중고 신입사원이지만 남들 앞에서 당당해진 게 좋다”고 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오너는 어려워
동료의 잦은 이직이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서울 강남의 기업용 서버 구축업체 채모씨(33)는 최근 한 달간 ‘퇴사파티’에 세 번이나 참석했다. 함께 일했던 선후배를 보내는 자리였다. 앞으로 못 볼 것이라는 서운함은 크지 않았다. 여건만 된다면 퇴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퇴사파티의 주제는 주로 ‘성공 후기’다. “점심시간엔 다이어트한다고 하고 나와서 카페에서 공부해라” “회식 자리에 초반부터 빠져 사회 부적응자 낙인을 받아 놓아라”는 나름의 ‘비법’도 전수된다. 그는 “서울대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특목고가 아니라 서울 시내 다른 대학들이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은 대학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며 씁쓸해 했다.
규모가 작다 보니 ‘오너’를 만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생긴다. 인천의 한 장비업체 경영기획실에서 기획 업무를 하는 박모 차장(42)이 그렇다. 자신보다 나이가 다섯 살이나 어린 2세 기업인을 상대하는 게 늘 스트레스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서다. 한밤중에 술먹고 불러내는 것은 일상사다. 얼마 전에는 그가 좋아하는 이종격투기 선수에게 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까지 사러 다녀왔다. ‘비서도 아닌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버텼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슬쩍 ‘민원’을 넣어 봤지만 돌아온 말은 “어쩌겠느냐”는 것이었다. 박 차장은 “남들은 2세와 친해서 좋겠다고 하는데 속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병뚜껑 제조사 영업사원 백모 대리도 2세 탓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는 사장 비서와 ‘썸’을 탔다. 밝고 당당한 모습에 끌렸다고 했다. 거래처 미팅이 끝난 뒤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속마음을 알고 싶다”고 해 고백했다. “사귀고 싶다”고 했다. 다음날 사장 호출에 그는 깜짝 놀랐다 “일은 안 하고 회사에서 여자나 꼬시고 있느냐”고 해서다. 알고 봤더니 비서는 사장의 딸이었다. 백씨는 “직원들 간 대화도 아버지에게 종종 얘기해 난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빠른 승진·제한없는 업무는 장점
중소기업이라고 고충만 있는 건 아니다. 일을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본인만 적극적이면 일할 기회가 많다는 것은 장점이다. 박모씨(37)가 경기 성남의 중소기업에 취직한 것은 2010년이었다. 행정고시에 6년을 매달린 끝에 포기하고 마지못해 들어간 회사였다.
하지만 회사 일은 ‘의외로’ 잘 맞았다. 해외영업 업무를 맡아 해외 전시회 등 바이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 갔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거래처 10여곳을 잇달아 발굴했다. 그가 새로 일궈낸 매출이 연 70억원을 넘겼다. 800억원 안팎인 회사 매출의 10%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2년 만에 대리, 6년 만에 과장 직급을 달았다. 성과급으로 한 번에 1000만원 가까이 받은 일도 있었다. 사장은 일을 잘한다며 내년엔 팀장을 달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출장 때 쌓은 항공사, 호텔 마일리지는 ‘덤’이었다. 매년 여름휴가를 이 마일리지로 거의 공짜로 다녀왔다. 박씨는 “마흔에는 해외 법인장으로 가겠다는 새 목표가 생겼다”고 했다.
헬스기구 제조사에 2015년 취업한 신모씨(26)는 ‘어쩌다’ 열심히 한 경우다. 이력서에 ‘러시아 회화능력 상급’으로 적었던 게 계기였다.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사실 그는 러시아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외국어 능력을 이력서에 쓸 땐 ‘읽을 줄 알면 상급, 글자 알면 중급, 인사말을 알면 초급’이란 말을 따랐다고 한다.
합격 후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다. 러시아 시장 개척 업무가 그에게 떨어져서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바이어와 미팅까지 잡혔다. 실력이 들통날까봐 미팅 전 2주가량을 밤을 새워가며 러시아 회화 공부를 했다. 구글 번역기를 돌려 이메일도 주고받았다. 이렇게 시작해 벌써 3년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신씨는 “지금도 출장갈 땐 비행기에서 회화책을 붙잡고 있다”며 “덕분에 진짜 러시아 전문가가 될 것 같다”고 웃었다.
안재광/조아란 기자 ahnj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