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공정성 시비…헌재, 자체규정 만들어야"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적법성 두고 다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탄핵심판 내내 절차 등의 적법성을 놓고 다툼을 벌인 것은 헌재법이 심판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민·형사소송을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 국회 측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민·형사재판과 구분되는 고유의 재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 법령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탄핵심판 절차를 규정한 별도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할 때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진술한 것이 아니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을 탄핵심판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 측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불리한 증거가 일부 채택됐다고 반발했다.
피청구인(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참여하면 탄핵소추인단 측이 신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어 모호하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출석하면 탄핵소추인단과 재판부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채택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3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 대심판정에 나온 사람은 25명에 그쳤다.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잠적하면 헌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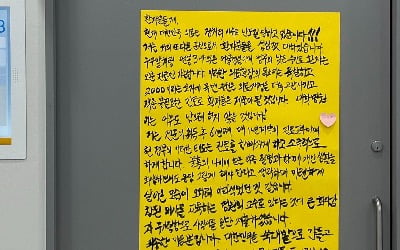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