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기자 칼럼] 노동개혁 '렛 잇 비(Let it be)'
![[선임기자 칼럼] 노동개혁 '렛 잇 비(Let it be)'](https://img.hankyung.com/photo/201612/01.13057123.1.jpg)
노동개혁은 그동안 크게 세 차례 변곡점을 맞았다. 양대 지침 논란으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뛰쳐 나가면서 추진 기반이 취약해졌다. 노동계의 국회 대거 진출과 여소야대를 가져온 ‘4·3 총선’으로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 소추와 새누리당 분당으로 추진 주체는 불명확해졌다.
변곡점 맞은 노동개혁
변곡점을 지나며 노동개혁의 범위와 성격도 변했다. 정부는 4개 관련 법안 추진과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확대 정도로 좁혔다. 무늬뿐인 개혁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총선을 겨냥해 강행을 고집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발목을 잡혔다.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여당의 분당으로 노동개혁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비우호적이다.
최근 정부는 다시 노동개혁을 향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에 관한) 모든 것은 장관 책임”이라며 “개혁법안 중 근로기준법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정부안은 통상임금을 명확히 정의하고, 휴일근로의 수당 중복(휴일근로, 초과근로)을 배제한 게 골자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수조원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심에서 중복 할증을 인정하는 판결(14건 중 11건)이 잇따랐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미루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무부처의 의지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는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는다. 노동계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안 말고도 야당 발의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44개나 된다. 여기서 ‘노사 관계에 누구보다 밝다는 평을 받는 이 장관이 왜’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우려되는 정부 행보
뒤늦게 전해지는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얽힌 얘기들은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케 한다. “서별관회의 때 청와대가 고용부를 제치고 직접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양대 지침을 직접 밀어붙였다” 등. 청와대는 부처 간 조율과 지원으로 국정을 이끈다. 디테일과 집행은 주무부처 몫이다. 감독이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선수가 제 능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조기 대선 및 개헌이 거론되는 정국에서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표심 공략은 뻔해 보인다. 정치권은 2013년 4월 ‘정년 60세법’이라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임금피크제 의무화라는 필수 규정을 제외하는 포퓰리즘을 보여줬다. 근로기준법은 불합리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부는 ‘법 개정=노동개혁 성과’라는 틀을 고집하지 말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치권을 설득하는 게 맞다. 노동개혁은 지금 무리한 추진보다 ‘순리(順理)대로(Let it be)’가 정답일 수 있다.
박기호 선임기자 겸 좋은일터연구소장 khpar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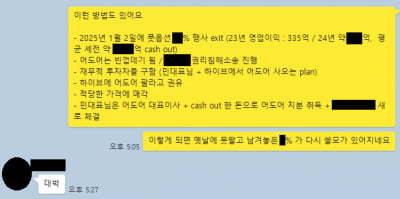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