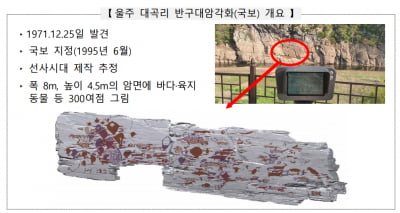'내우외환' 서울대
법인화 5년 만에 예산 처음으로 삭감
靑 인사 개입설에 총장 퇴진운동까지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이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9일 “총장 선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간택한 총장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장 역임(逆任·거슬러 임명함)’이라고 적힌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2014년 6월15일치 메모가 드러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성 총장은 경합을 벌인 오세정 교수보다 열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 이사회 간선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총장에 선출됐다. 김 전 수석의 메모는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대 측은 “흘려 쓴 필기체 글씨로 역임이 아니라 선임(選任·여러 사람 가운데 임명함)”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성 총장이 ‘코너’에 몰리면서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 연구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로 추진하던 시흥캠퍼스 건립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총학생회는 두 달째 본관 점거를 풀지 않은 채 학교와의 공식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 품을 떠나 독립채산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내년도 서울대 정부출연금을 21억원 삭감한 4530억원으로 결정했다.
공대의 한 교수는 “정부출연금의 80%가량이 원래 공무원 신분이었던 서울대 교직원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들어간다”며 “연구 등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21억원을 깎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서울대의 한 원로교수는 “경쟁자인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혈안인데 서울대는 내홍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서울대는 1등 국립대라는 이유로 각종 연구지원비를 싹쓸이하다시피 한다”며 “스스로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지금의 서울대는 누리기만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