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에 3500만원…폭죽값 인상에 부산불꽃축제 '울상'
이 광경은 광안리와 동백섬 등에 운집한 127만 명이 즐겼다.
하지만 이런 불꽃축제가 폭죽값 인상으로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부산 불꽃축제에 들인 돈은 16억500만원 가운데 5억여원이 순수 폭죽값이다.
나머지는 설치비와 바지선 대여비 등으로 사용됐다.
폭죽 가격은 한 발에 최소 4천95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른다.
이번 불꽃축제에서 터진 폭죽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대통령 불꽃'이라는 별명의 25인치짜리 폭죽이다.
500m를 솟구쳐 400m 크기의 불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한 발 가격이 3천575만원에 달한다.
바다 위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상 부산 불꽃축제에서만 터뜨릴 수 있다.
이 폭죽의 가격은 2005년 첫해에는 1천498만2천원이었다.
2010년 1천648만원, 2012년 2천359만원, 2014년 3천5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인상됐다.
폭죽을 공급하는 한화는 축제 초기 폭죽 판매단가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다가 2011년부터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매년 공급가격을 5%씩 올리고 있다.
내년 '대통령 불꽃' 한 발의 가격은 3천850만원에 이르고, 2018년에는 최소 5천50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한화가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부산시는 불꽃축제를 계속하려면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화가 3억원을 현물로 매년 지원한다지만 폭죽 가격이 해마다 인상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손상용 의원은 "2012년 이후 부산 불꽃축제는 전야제를 포함해 이틀에 걸쳐 열렸지만 올해는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하루만 열렸다"며 "폭죽 가격이 이대로 계속 오르면 부산 대표 가을 축제인 불꽃축제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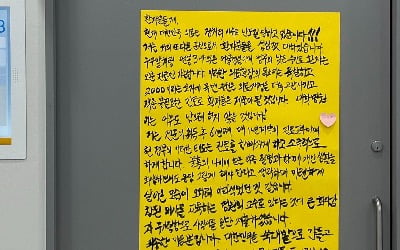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