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 인 블랙박스', 자발적 감시사회의 도래…"우린 블랙박스에 갇혔다"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도시의 숨겨진 속살을 보기 위해 위지처럼 굳이 사고 현장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폐쇄회로TV(CCTV)나 블랙박스 같은 카메라들이 도시 곳곳에(어쩌면 거의 전역에) 깔려 있으니 말이다. 그중에서도 차량용 블랙박스는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풍경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더 역동적이다. 블랙박스에 담긴 사건·사고들은 안온해 보이는 도시의 살벌한 민낯을 드러낸다.

지난 8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맨 인 블랙박스’는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 그동안 축적한 아카이브를 활용해 정보와 오락을 함께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교양 프로그램이다. 방송인 김구라 씨와 최기환·김선재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순히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누가 얼마나 더 책임이 있는지를 전문 변호사를 출연시켜 알려주기도 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 고개를 돌려 좌우를 직접 살피는 이른바 ‘숄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못해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운동장에서 실험을 통해 보여주기도 한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도로 위의 사고 장면만이 아니다. 가스 배관 폭발사고나 물탱크가 터져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도로 장면 같은 것들도 블랙박스에 포착된다. ‘맨 인 블랙박스’는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들을 수천, 수만개의 천리안으로 들여다보는 듯 짜릿한 체험을 안겨준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미디어 이론가 마셜 맥루한이 이 프로그램을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블랙박스라는 새로운 미디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도시 곳곳에 숨겨진 일까지 낱낱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벌거벗은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서로가 서로를 찍어대며 그것을 증거 삼아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발적인 ‘감시 사회’의 도래. 지금 당신의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우리는 어쩌다 모두가 ‘블랙박스 속의 사람들(맨 인 블랙박스)’이 됐을까.
정덕현 < 대중문화평론가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단독]"세금으로 밀린 직원 월급 주네"...선넘은 '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올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789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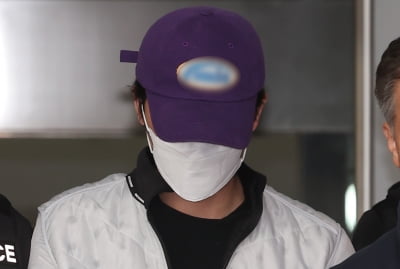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노인들은 아무리 말려도 왜 운전대를 놓지 않을까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6756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