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롯데 지배구조, 檢 수사 '복병' 되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있는 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 중인 검찰이 총수 일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문제를 상세히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29일 "일본 롯데물산의 주주 구성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향후 일본과 한국의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회사들의 주주 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구매 중간에 끼어들어 거액의 부당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그동안 그룹 측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어음 이자를 낮추고자 일본 롯데물산의 신용을 이용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소명 자료 요구에는 '일본 주주의 반대' 등을 이유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외견상으로는 검찰이 롯데 측의 비협조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비자금 의혹과 함께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실체를 파헤쳐보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롯데가 그동안 한번도 본격 수사를 받지 않았던 배경에는 한국-일본을 넘나드는 복잡한 지배구조도 한 몫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곤 했다.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지배구조 탓에 그룹 내 정확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이 수개월 간 내사 과정에서 가장 고민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었다고 한다.
국내 계열사간 자금이 오가다 갑자기 일본 계열사로 넘어가는 경우 자금 파악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로 롯데에 대한 내사 중 몇 차례 금융계좌 영장이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이번 수사도 최근에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및 내부 사정 등에 가로막혀 선뜻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롯데의 지배구조는 작년 7월 시작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 때 처음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는 일본에 있는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의 지배력 아래 있다.
LSI가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은 73%에 이른다.
L1에서부터 L12까지 12개의 L투자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린 LSI의 지분 60%는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 롯데홀딩스가 갖고 있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 광윤사(고준샤·光潤社) 28.1% ▲ 종업원지주회 27.8% ▲ 관계사 20.1% ▲ 임원 지주회 6% ▲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 가족 7.1% ▲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뉜다.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경우 지분의 99%를 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重光初子),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네 명이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롯데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속에 일본 계열사를 지배하고 이들 일본 계열사들이 다시 호텔롯데 등 한국 롯데의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는 셈이다.
한국 롯데는 작년 말 현재 67개 순환출자 고리로 엮여있다.
전체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94개 가운데 무려 71%가 롯데그룹에 속한다.
더구나 36개 일본 계열사와 86개 한국 계열사 중 8개를 제외한 업체들이 모두 비상장 회사여서 외부에서 거래 관계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조다.
사상 최대 인력을 동원해 휘몰아치듯 40여개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초반 기선을 제압한 검찰 수사가 최근 며칠간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도 '지배구조의 덫'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관건은 검찰이 일본 내 지배구조와 한국 계열사와의 거래관계를 얼마나 세세하게 파악하느냐다.
이는 현지 개별 기업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이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일본과의 사법공조를 최근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한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충분한 내사를 거쳐 '이 정도면 할만하다'는 확신이 섰기에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정보가 충분치 않은 일본 계열사가 주요 변수로 등장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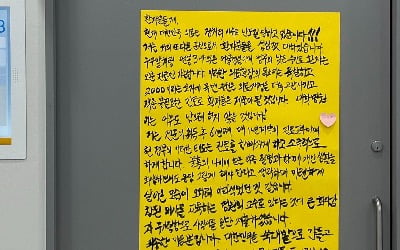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