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홍만표 변호사와 '물러나는 용기'
박한신 법조팀 기자 hanshin@hankyung.com
![[Law&Biz] 홍만표 변호사와 '물러나는 용기'](https://img.hankyung.com/photo/201605/AA.11762309.1.jpg)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식의 대책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법조계 현실이지만, 이는 실현가능성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한 방안이다. 법조계 각 분야의 순혈주의를 고착화시킬 거란 주장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전관의 힘을 이용한 홍 변호사의 무리한 영업을 두고 세간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추측이 나온다. 한 가지는 그가 고향인 삼척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했고, 이를 위해 무리하게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검사로서 오랫동안 누려온 권력의 상실을 돈으로 채우려 했을 거란 짐작이다.
이 같은 얘기들은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국 사회 주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퇴직 후 정치권을 기웃거리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는 대법관, 검사장 출신들의 모습을 ‘상실감’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다. 주류로서의 지위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 자리’에 목숨을 건다는 얘기다. 수많은 ‘관피아’ 논란을 생각하면 비단 법조계뿐만의 얘기도 아니다. 국무총리 출신 인사가 외국계 금융사의 로비스트로 일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미국은 다르다. 데이비드 수터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권력과 명예가 둘째라면 서러울 자리를 2009년 그만두고 고향 뉴햄프셔로 돌아갔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나이는 69세였다. 현재는 고향에서 하급심 판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도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2006년 은퇴했다. 한국의 고위직들은 언제쯤 ‘물러나는 용기’를 보여줄까.
박한신 법조팀 기자 hansh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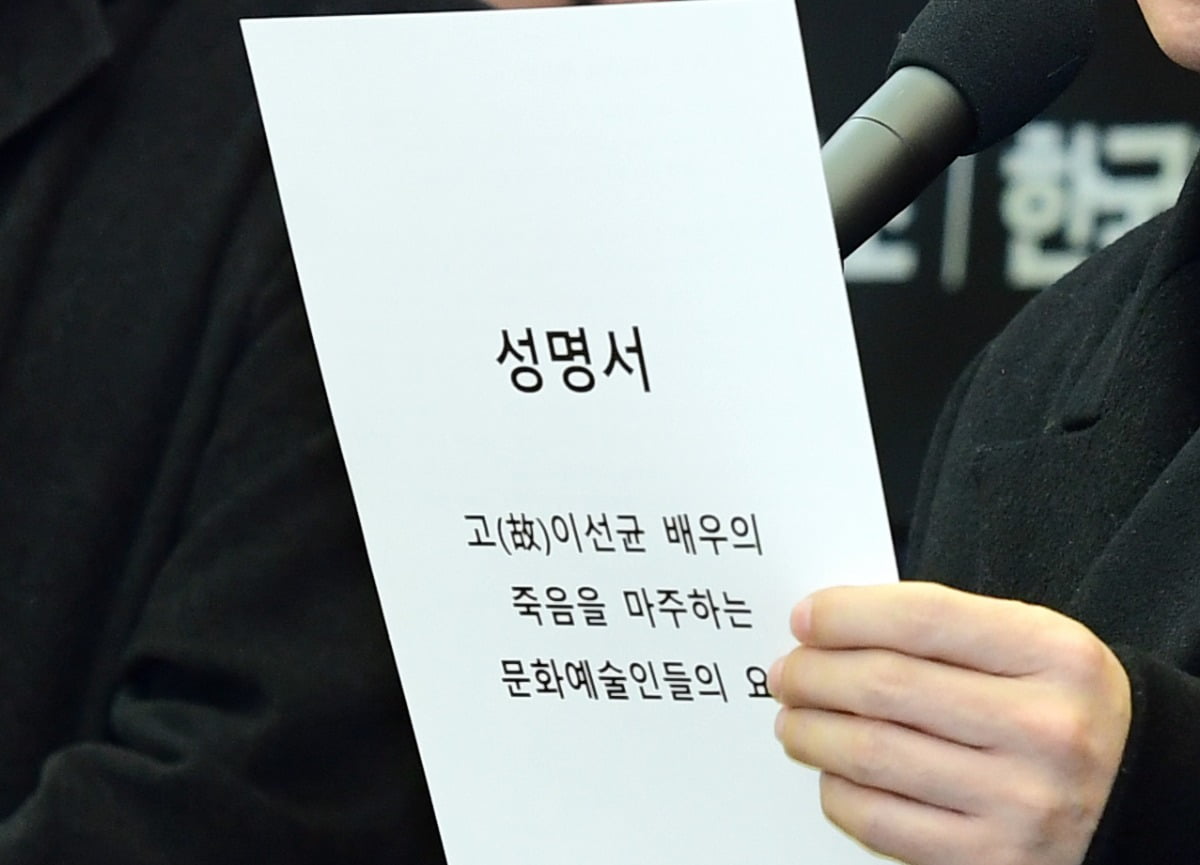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