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이주노동자 없으면 중기 공장 스톱…워킹맘은 사표 써야할 판"
지방대 석·박사과정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작년 한국국적 취득자 1만4000여명뿐
국민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여전
같은 날 서울 압구정동의 한 김밥집에선 ‘조선족(중국 동포) 이모’ 두 사람이 잽싼 손길로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였다. 이들은 “영세한 식당이나 주점 같은 데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 상당수는 조선족”이라고 말했다.
공장과 식당, 두 곳의 대표적인 현장을 예로 들었지만 이주노동자는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이주노동자 없으면 중기 공장 스톱…워킹맘은 사표 써야할 판"](https://img.hankyung.com/photo/201510/AA.10700756.1.jpg)
영세한 공장은 이주노동자를 써서 생산단가를 낮추고 납기를 맞춘다. 김 대표는 “이주노동자는 잔업을 선호해 납기를 지키기가 수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숙련공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데 비자 문제로 출국한 뒤 다시 고용하기까지 오래 걸려서 곤란하다”며 “정부가 제도를 좀 고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는 것도 이주노동자들이다. 소·돼지를 키우고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 가운데 상당수는 농번기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일손을 채운다. 정식 비자를 받고 들어온 고용허가제 인원 중 농·축산업에 할당된 이들이 5600여명에 불과해 대부분 불법체류자를 쓴다. 법무부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4일부터 충북 괴산과 보은 두 곳에서 시험적으로 농번기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을 정도다.
어촌도 사정이 비슷하다. 인천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 관계자는 “부두에서 수산물을 운반하는 일은 육체노동 강도가 높아 한국인을 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정식으로 허용하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 중에는 이민법을 도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지방 대학의 석·박사과정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진 지 오래다. 한국 학생들은 서울·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 지방대 교수는 “외국인 석·박사과정생 중 상당수가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데 비자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고 했다.
육아도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역할이다.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워킹맘 가운데는 “조선족 이모(베이비시터) 없으면 당장 사표를 써야 할 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내국인 일자리 대체수준 낮아”
하지만 온라인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글이 넘쳐난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경향도 뿌리 깊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이민을 늘리는 것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이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을 했을 때는 63.5%가 ‘부작용이 염려되므로 외국인의 국내 이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민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공급 확대는 잠재성장률 제고의 필수조건”이라며 “단순기능인력에 의한 생산도 전체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숙련 기피업종 종사자 없이 모두가 고부가가치 제품만 생산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를 뺏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해소될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수준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상은/이현동 기자 se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겁나서 휴대폰 못 만지겠어요"…3000만원 날린 사연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7065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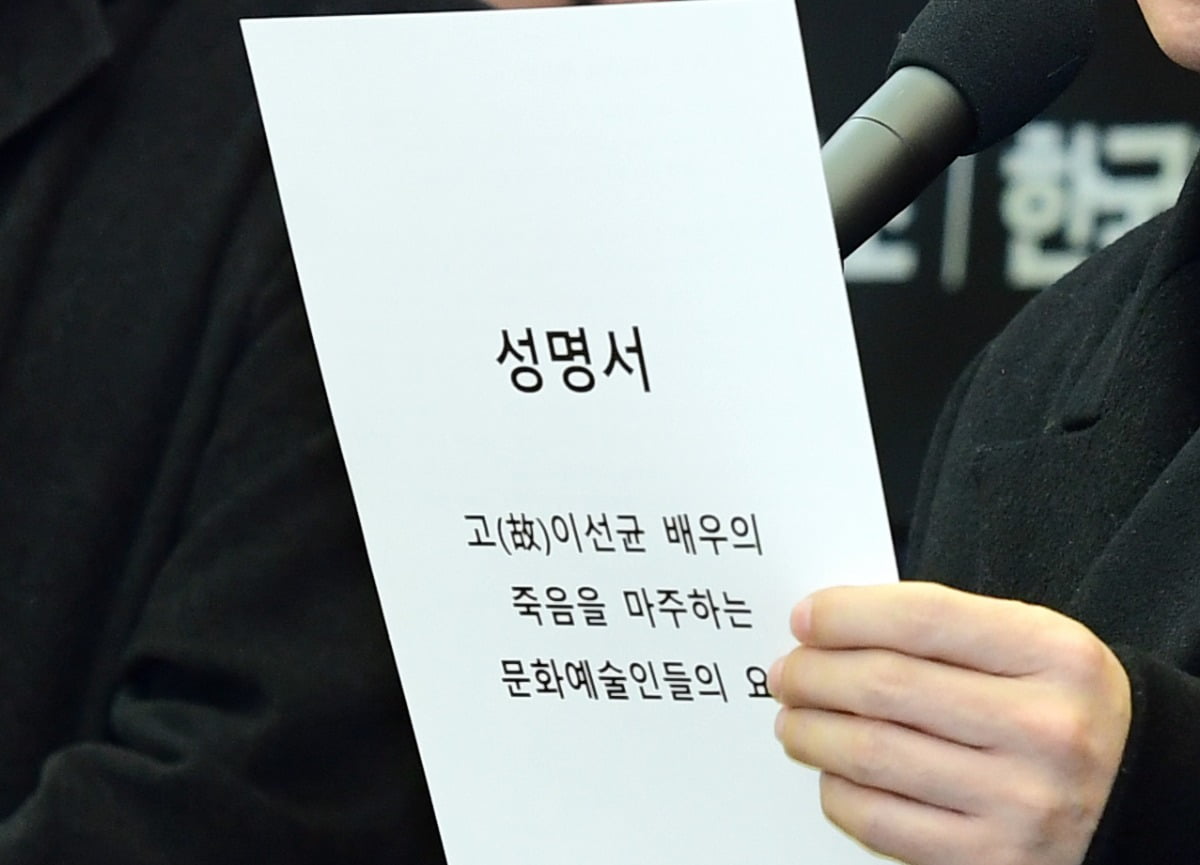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