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과장 & 李대리] 'IT 까막눈' 상사 모시기가 어려워 ㅠㅠ
인터넷뱅킹·쇼핑까지 대행…"저 돌쇠 아니거든요"
피처폰 고집 팀장님 미워요
관련 기사·동영상 공유 못해…문자도 여러번 나눠서 보내고
팀 막내에게 배우는 김 과장
막내 '태블릿 PT' 접한 팀장, 다른 보고서는 번번이 '퇴짜'
후배에게 IT 배우느라 '뻘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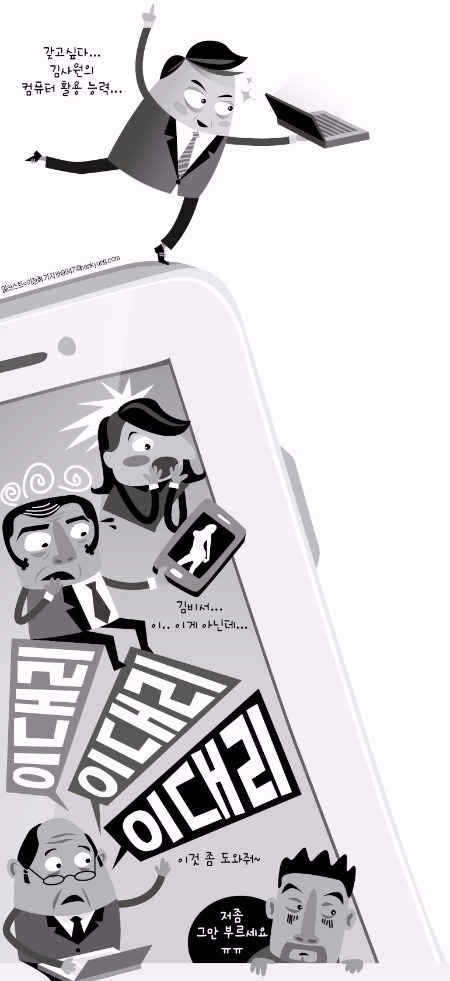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직장 내 세대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선임자는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신세대 후배들에게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다. 옛 기술을 모르는 신세대 직장인은 선배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난감할 때가 생기기도 한다.
인터넷뱅킹도, 쇼핑도 부하들에게
보험사에 근무하는 이 대리(31)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부장의 전화 때문에 일상업무에 지장을 받을 지경이다. 부장은 이메일 확인만 겨우 할 줄 알고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은 전혀 다루지 못한다. 부장이 해야 할 일이지만 “나이 많은 내가 뭘 알겠냐, 도와달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부장의 결재를 대신해주고 있다.
회사에 있을 때 자주 불려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근하고 있을 때까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는 부장 전화에 노이로제가 생길 정도다. 기본적인 기능만이라도 가르쳐보려고 했지만, 부장의 “귀찮다”는 한마디에 포기해버렸다.
심지어 부장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연말정산도 이 대리의 몫이다. 이 대리는 부장이 인터넷뱅킹과 인터넷쇼핑을 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다. 부장의 연말정산을 두 번이나 처리했기 때문에 그의 연봉 상세내역도 파악하고 있다. 이 대리는 “컴퓨터도 다루지 못하는 부장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오 대리(33)는 요즘 김 부장에게 시달리고 있다. 업무 때문이 아니다. “휴대폰은 전화만 잘되면 된다”며 고집하던 김 부장은 한 달 전 아이폰6를 들고 출근했다. 대학에 다니는 딸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사줬다. 동료들은 “따님 잘 두셨네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나 문제는 김 부장이 부서 막내 오 대리에게 이것저것 주문을 하면서 시작됐다. 새 스마트폰을 들고 출근한 첫날, 김 부장은 오 대리에게 “오늘 안에 원래 쓰던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와 사진을 아이폰으로 옮겨달라”는 명령을 내렸다.
삼성의 갤럭시폰을 사용해 아이폰에 익숙하지 않던 오 대리는 반나절을 포털사이트를 뒤지며 낑낑대다 결국 회사 인근 휴대폰 대리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김 부장은 이후 등산 갈 때 들을 음악을 어떻게 담는지, 앱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등 시도 때도 없이 질문공세를 펼쳤다. 참다못한 오 대리는 어느 날 “딸한테 물어보시죠”라고 답했다가 바로 윗선임에게 “부장 심기 건드려서 부서 분위기 망치지 말라”며 싫은 소리를 들었다.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왜 갑자기 스마트폰을 사서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오 대리의 하소연이다.
부장님 휴대폰에 음란사진이…
한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 비서(29)는 요즘 이 부장(51)을 마주칠 때마다 불편하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최근 이 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이 부장의 사진첩에서 개인적으로 찍은 음란한 사진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기계치’인 이 부장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김 비서를 찾았다. 그럴 때마다 김 비서는 친절하게 사용법을 설명해줬다.
그러다 최근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장은 “어제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김 비서에게 도움을 청했다. 김 비서는 “그건 어렵지 않다”며 이 부장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카카오톡에서 파일 첨부 방법을 설명하던 김 비서는 이 부장 휴대폰 사진첩에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랐다. 의도하지 않게 스크롤바를 한 번에 확 아래로 내리는 바람에 사진첩에 저장된 음란한 사진들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놀란 것은 김 비서 옆에서 사진 전송법을 배우고 있던 이 부장도 마찬가지였다. 이 부장은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황급히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이 일이 있은 뒤 재단 내부에서는 ‘이 부장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안 좋은 소문이 돌았다. 김 비서는 “내가 낸 소문도 아닌데, 이 부장이 오해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처폰 고집하는 팀장 때문에…
건설사 홍보팀에서 일하는 홍 과장(34)은 아직도 피처폰을 고집하는 김 팀장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 김 팀장은 “‘남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게 좋다”며 피처폰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김 팀장이 외근 나갈 때 팀에는 언제나 비상이 걸린다. 포털사이트에 회사에 불리한 기사가 나와 즉각 보고해야 할 때, 한창 작업 중인 광고시안을 급하게 결재받아야 할 때 등 팀장에게 스마트폰이 없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것은 기본이고, 문자를 여러 번 나눠서 보고해야 하는 것도 고역이다. 다른 회사 홍보팀은 카카오톡으로 각종 기사와 동영상까지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회의하는데, 홍 과장네 팀원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팀장의 답신만을 기다리는 처지다.
후배 직원이 ‘IT 스승님’
공기업에 다니는 유 과장(40)은 최근 팀 막내인 김 사원(31)의 ‘가르침’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직급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유 과장이 김 사원에게 지시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김 사원의 뛰어난 정보기술(IT)기기와 컴퓨터 활용능력이 두 사람의 입장을 바꿔놓았다.
김 사원은 최근 태블릿PC를 활용해 실적 관련 발표자료를 화려하게 만든 뒤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팀장은 다른 직원의 보고서는 “김 사원의 보고서에 비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번번이 퇴짜를 놨다. 결국 팀 내 선임자들이 김 사원의 도움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IT기기 활용법도 배우기 시작했다.
유 과장은 “처음엔 한참 어린 후배에게 배운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팀장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도와달라고 부탁한다”며 “뭔가를 배우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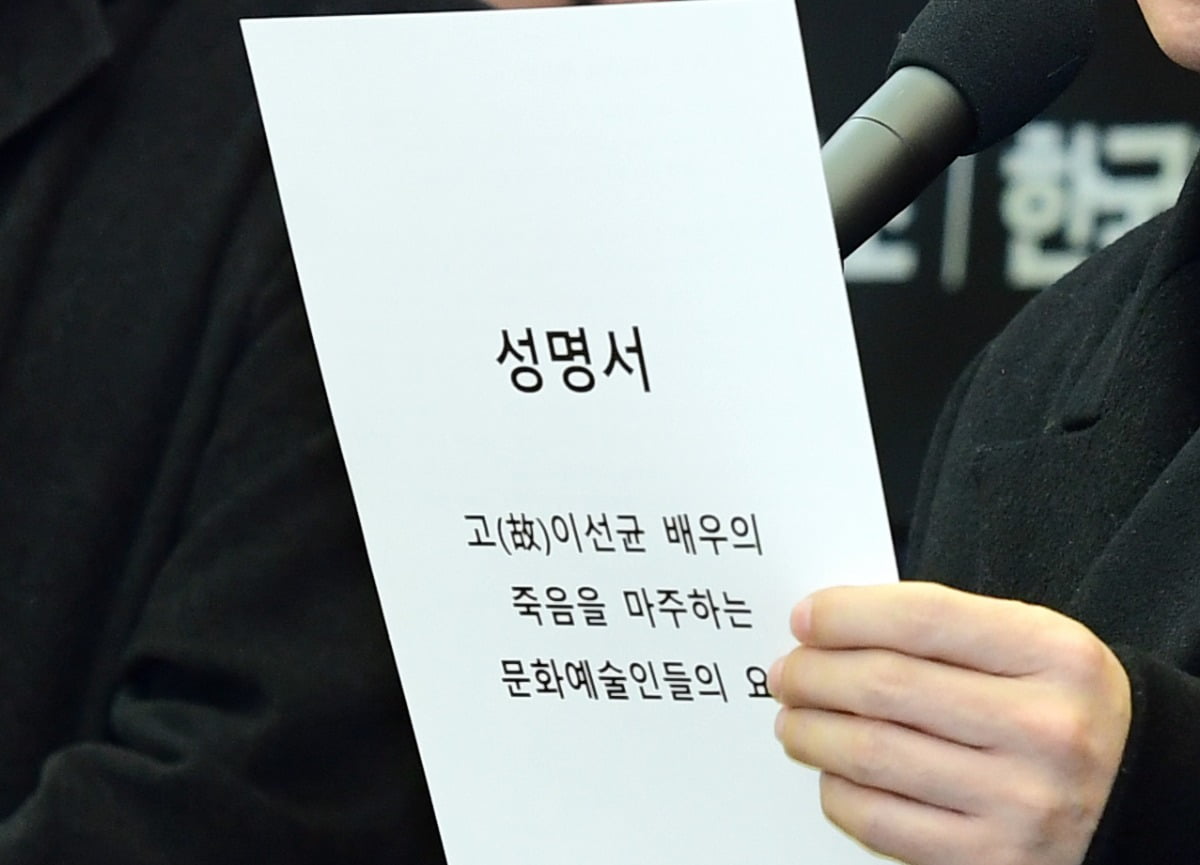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