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증거수집 원칙, 재판마다 '고무줄'
정소람 법조팀 기자 ram@hankyung.com
![[Law&Biz] 증거수집 원칙, 재판마다 '고무줄'](https://img.hankyung.com/photo/201409/02.6936174.1.jpg)
그러나 재판부는 ‘미란다 원칙’(불리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의무)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만든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 원칙이 피고인(혹은 변호인)의 의지에 너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검찰이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 각 벌금 1억원씩을 구형한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에서 임의 제출받은 임직원들의 메모가 증거로 제출됐다. 공정위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한 메모를 검찰이 넘겨받아 낸 것으로, 법원은 변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증거로 받아들였다. 만약 이 사건의 경우도 변호인 측이 '억울하게 수집당한 증거'라고 버텼다면 이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행정기관이 이와 비슷한 방식의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 될 우려도 적지 않다. 공정위 외에 국세청·금융감독원·고용노동청 등은 현장 단속이나 조사를 벌인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2차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단속을 벌이는 행정기관이 현장에서 증거를 압수할 수 있어야 피의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줄어든다”면서도 “변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털어놨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절차적 적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리는 있다. 그러나 지나친 ‘원칙의 남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증거 배제 법칙과 관련해 좀 더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정소람 법조팀 기자 ra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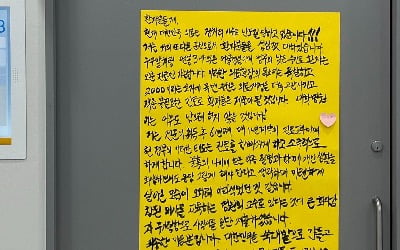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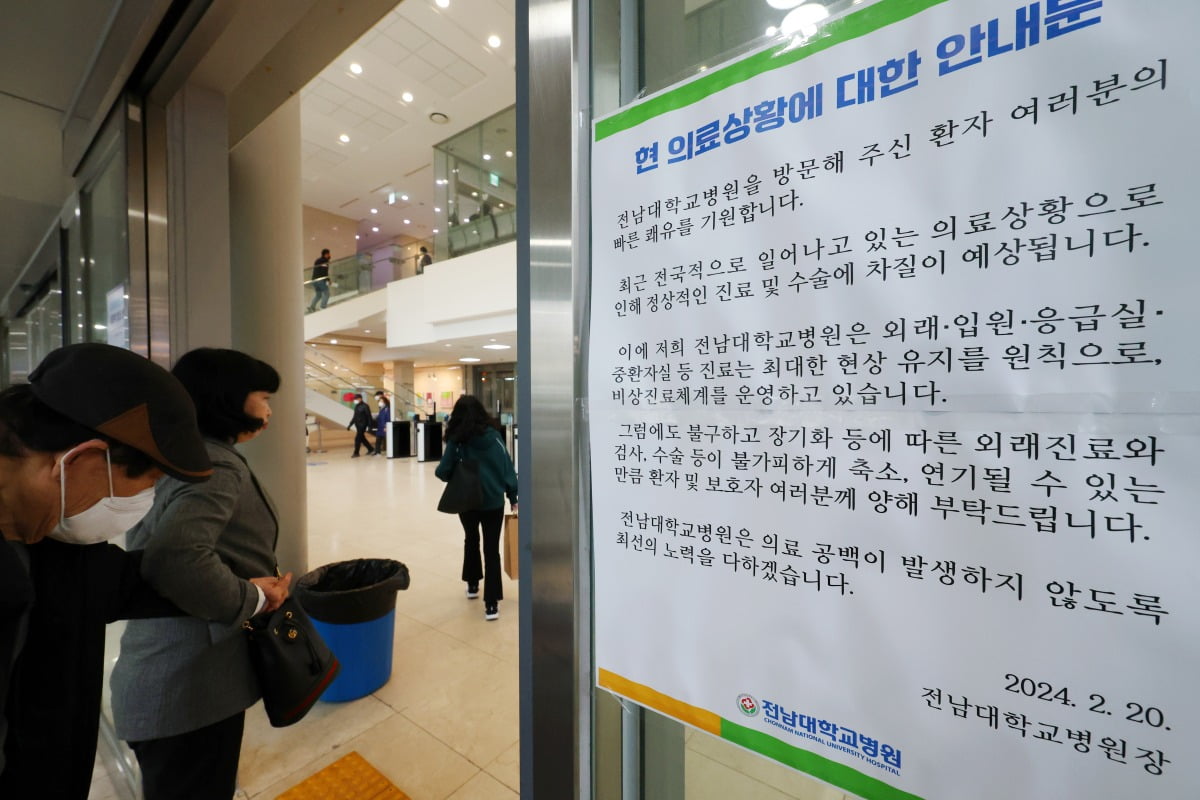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